
道, 전국 최초로 개개인에 지역화폐 지급
수혜대상·액수·분담률 등 30만 농민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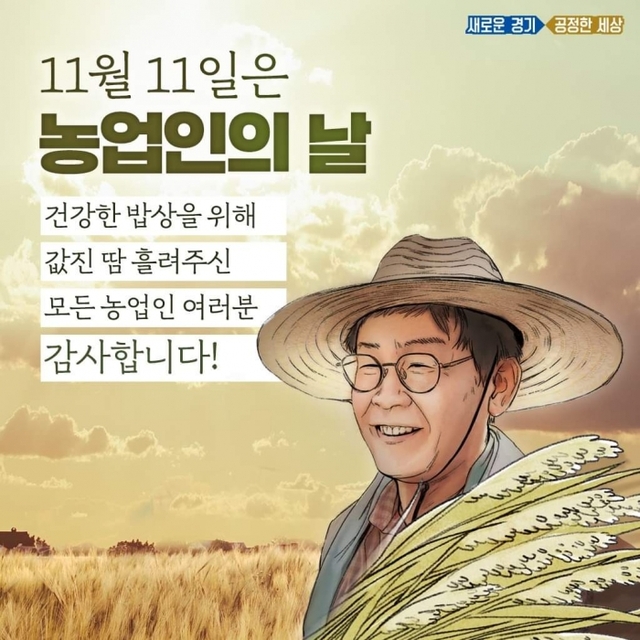
30만 경기 농업인이 주목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이 연내 발표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될 정책인 만큼 수혜 대상, 액수, 연계 정책 등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기본소득이 ‘농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농업인의 날인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으로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을 도민에 공개, 내년 초부터 시ㆍ군 및 농민과의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농민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실험 2탄이다.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매년 지역화폐를 지급, 농업의 공익 측면과 어려운 농민 형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 원) 등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 개인을 겨냥한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례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 농민 기본소득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농민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통계청 실시의 직업 인구 조사에서는 도내 농민이 29만6천 명(전국 12.7%)이다. 다만 통계청의 집계 방식으로는 소규모 농업인, 귀농인, 다른 직업인 중 농업 활동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특히 도가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도 검토함에 따라 수혜 대상에 이목이 쏠린다. 재원도 문제다.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17만 5천 명 대상으로 연 100만 원ㆍ연간 1천750억여 원 투입)의 액수가 타 시ㆍ도의 농민수당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이를 그대로 농민 기본소득에 적용 시(농민 30만 명 기준) 소요 재원이 연간 3천억여 원에 달한다.
예산이 큰 만큼 분담률도 추후 갈등 요소로 꼽힌다. 3대 7(도와 시ㆍ군)인 청년 기본소득도 논의 당시 시ㆍ군과 도가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ㆍ군이 주요 집행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여러 쟁점이 첨예한 만큼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시ㆍ군, 농민과 깊게 소통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시행이 목표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맡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한 밥상을 위해 값진 땀을 흘려준 모든 농업인 여러분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며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 농촌, 우리 농민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