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계석의 문화돋보기] 클래식에 혁신적 변화 몰고 올 방송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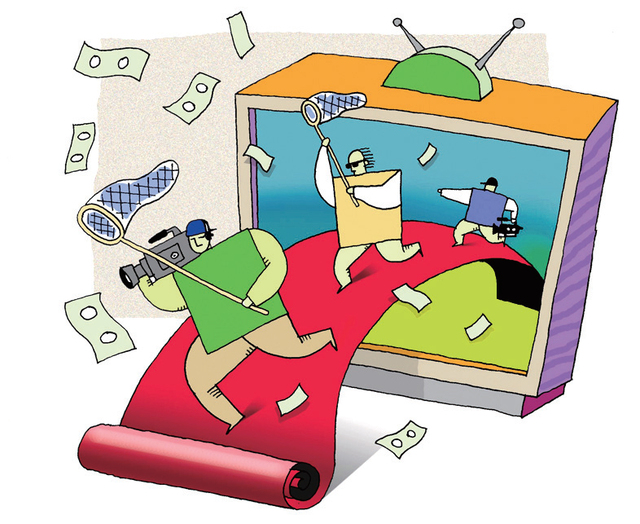
이같은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방송이 상업성이 짙은 이이돌 스타나 오락, 먹방 등의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이런 방송에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 자정 넘어 억지춘향격의 클래식 편성을 했다가 어느새 사라지곤 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의무조항이 없으니 예산 편성도 없다.
시행령 제57조 ② 항에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도 몰랐던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견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업무에 종사했던 박경규(전 KBS FM 라디오, 전 국악방송 본부장) 작곡가에 의해서다. 수면 하에 있던 것을 향락 문화의 퇴조와 주 52시간 근무로 건강한 방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중음악만을 음악의 총체로 규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서명 작업을 통해 여론 조성을 해야 한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동요를 비롯해 합창, 오페라 등 클래식 전반에 실로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순수음악프로그램이 없으므로해서 발생하는 폐해도 적지 않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순수 분야의 에술가들이 처한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오랜 유학에서 돌아와도 이들이 일할 곳은 대학뿐이다. 그 대학이 이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이들의 뛰어난 역량이 死徵(사징)되고 있다. 방송은 열악한 구조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방송을 잃은 클래식은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를 갖지 못해 시장 형성을 할 수 없었다. 급기야 동네 학원마저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순수문화의 위기는 바로 기초문화의 위기인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 번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이 된다면 서구 편향적인 프로그램의 편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바야흐로 한류를 타고
우리 작곡가의 우수한 우리 작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에 소개되어야 할 타이밍이다. 방송의 고급문화 수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의 균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다. 말초적인 자극의 문화가 아니라 품격과 힐링을 주는 문화로 사회의 갈등과 소통, 치유 역할도 맡아야 한다.
우리의 K-Pop이 세계 도처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못지않게 전통문화와 현대화한 작품들이 조명 받아야 한다. 비단 음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무용, 연극, 문학 등 여러 장르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확산일로에 있는 각종 동호인 문화가 상승하면서 클래식 시장 기반을 반등시킬 것이다.
때문에 방송도 사회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국민들에게 삶의 비타민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소프트위어 공급이 필요하다.
참으로 방송의 힘이 막강하다. 순기능을 한다면 예술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의 건강 지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각 협회, 예술단체, 사회단체의 동참이 필요하다. 선진 방송의 사례를 수집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의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해서 예술도 공급자인 예술가와 소비자인 시민이 방송이란 매개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시장을 구축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