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실크로드 문명교류史 갇혀있던 시야를 넓혀주다…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기존 한·중·일 문화적 교류 이외
동남아·인도 확장 가능성 조명
교역물품 등 뒷받침 사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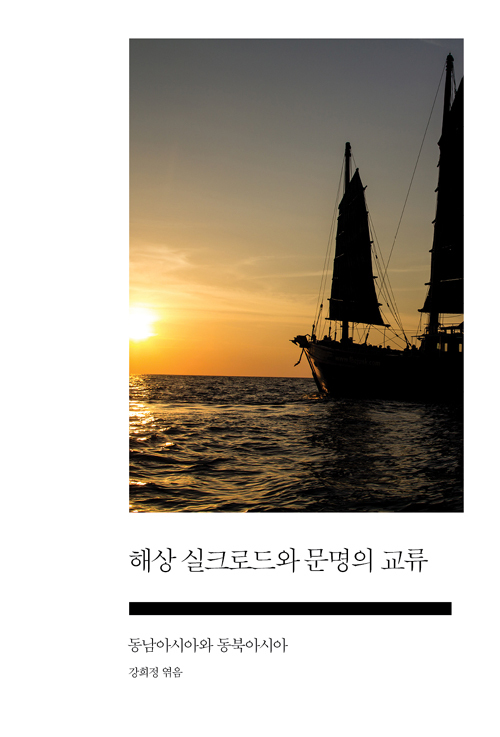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사회평론아카데미 刊)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사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다.
강희정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권오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아마라 스리수챗(AMARA SRISUCHAT) 전 방콕국립박물관장, 김영미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사, 쩐 득 아인 썬(TRAN DUC ANH SON) 전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저자로 참여해 그동안 한반도와 중국에 갇혀있던 해상 실크로드의 시야를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확장해 다룬다.
책은 먼저 해상 실크로드가 언제 어디서 시작돼 어떻게 발전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먼저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업적 교역을 촉진시킨 것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핀다.
다음으로는 권오영 교수가 근래 이뤄진 발굴 성과를 기초로 유리제품과 옥제품, 토기, 도기, 와당 등을 통해 동남아와 동북아 간에 다양한 접촉이 있었음을 추정한다. 특히 권 교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원 전후부터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간에 물질적, 문화적 교류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강희정 교수(서강대)의 글도 이와 비슷하게 동남아의 산물이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된 것을 규명했다. 주로 사서(史書)를 통해 동남아 각국의 산물이 조공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불교적 맥락에서 쓰임새가 있는 향과 향목 종류가 한국에서 발견된 사례를 제시한다.
아마라 스리수챗 박사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도 불교국가인 태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석가모니의 본생담 미술이 만들어진 것, 코끼리가 상서로운 상징이 된 것이 인도로부터의 원형 전래에 기인했음을 밝혔다. 불교의 전래 통로인 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영미 학예사는 1975년에 발견되어 1976~1984년까지 신안에서 발굴된 도자기 가운데 흑유자의 형식과 양식을 분류했다. 발굴된 2만여 점의 도자기 중에 832점에 달하는 흑유자의 다양한 제작지와 제작기법이 일찍이 주목을 받았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서 시도된 세밀한 분석과 그로 인한 제작지 추정은 중국과 한국의 도자사, 중국의 수출 도자, 그리고 당연히도 선행 연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흑유자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준다.
쩐 득 아인 썬 박사는 도 스 끼 끼에우에 대해 다룬다. 도 스 끼 끼에우는 청화백자를 말하며, 쩐 득 아인 썬 박사는 17~20세기 초에 베트남 황실에서 중국에 주문해서 받은 중국수입자기를 연구했다. 그는 베트남 황실의 여러 궁에 전해진 중국의 청화백자를 시기별, 기형별로 분류하고 때로는 그릇에 쓰인 명문과 한시(漢詩)를 검토하여 이들 도자기의 편년을 제공하고 베트남 황실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알려준다. 값 2만원
송시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