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종교] 불교와 천주교의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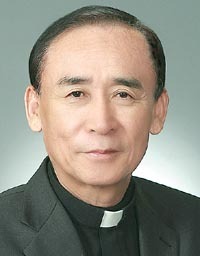
고맙다고 할까요, 저는 천주교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편파적이거나 절대적인 근본적 사고에서 그런대로 벗어나 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의 집안 어른들 중엔 스님도 계셨고 목사님, 장로님도 계셨기 때문에 한 종교의 고집스러움에서는 많이 벗어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학교 생활 내내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개신교의 역사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깨우쳐 갈 수 있었는가 하면 불교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한 학자이신 동국대학교의 불교대학장까지 역임하셨던 이기영 박사님이 불교에 대한 깊은 현의(玄義)에 맛을 들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욱 타 종교에 대한 거리감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한창 군사정권과 대립하는 어두운 사회의 분위기에 휘말려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천주교회의 제일 큰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느 자리에서 “나는 가끔씩 절을 찾곤 하는데 대웅전 부처님 앞에 가서 예를 드리고 조용히 정좌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성당에서 잠심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좌치(坐馳)가 되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하신 말씀이 내내 잊혀 지질 않았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걸까 하였는데 한참 후에 법정 스님이 도반들과 불자들에게 귀한 법회를 열곤 하시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 김 추기경님이 가셔서 가르침을 하신것을 시작으로 법정 스님도 그 화답으로 명동성당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신 귀한 종교 교류의 시작은 우리 종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길상사가 개산(開山)을 준비하면서 귀한 불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관음상입니다. 이 불상은 천주교 신자인 서울대의 조각가인 최종태 교수에게 의탁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불상은 이렇게 보면 천주교의 예수님의 모친 성모님의 자태가 자상하게 엿보이고 저렇게 보면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절로 비쳐지는 신기한 상입니다. 이것은 종교간 화해의 염원이 담긴 관음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큰 인물이셨던 오경웅 박사는 우리 천주교로 들어오면서 “나는 불문에서 씨줄을 얻고 천주교에 와선 날줄을 얻었노라”고 하면서 불교에 머물렀던 기간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명한 ‘동서의 피안(東西의 彼岸)’이란 책에서 소상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말합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의 종교는 ‘신은 누구인가?’ 라는 화두에서 불교와 같은 동양종교에선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란 질문에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관상이라든지 묵상의 방법을 불교의 참선의 길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법조계에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김홍섭 판사의 ‘무상(無常)을 넘어서’란 자전적 책에서도 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靈性)의 대가라고 일컫는 토마스 머튼 신부의 영성은 오히려 우리 천주교보다도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거나 그분의 영성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부터 불교에선 예수성탄일에 절 앞에 축하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직접 스님들이 성당에 오셔서 축하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우리 성당에서도 석가탄신일에 앞다퉈 성당 정문에 축하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때론 인근 절을 찾아가 함께 경축의 예를 드리곤 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최 재 용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수원대리구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