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과 두보의 시를 다시 보다 ‘이두시신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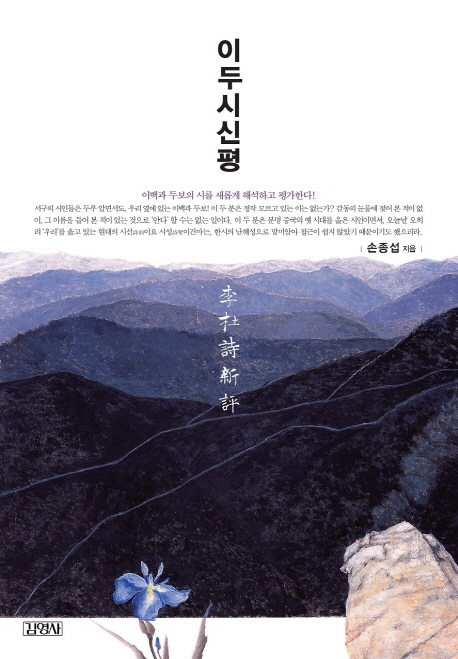
시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도 시 한 수 읊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한시 ‘등고(登高)’는 어떨까. 교과서에 실려 비교적 익숙한 작품으로 내용도 이 가을에 음미하기에 딱이다.
싸늘한 가을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높은 언덕에 앉아, 늙고 병든 몸으로 한 잔 술로 슬픔을 푸는 심정을 그렸다.
헌데 시인 자신이 아닌 후대의 학자들이 한자를 해석하다보니 엇갈리는 견해가 존재한다. 두보의 등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의 결구 ‘신정탁주배(新停濁酒杯)’에 대해 통상적으로 ‘술을 끊는다’고 해석한다.
이에 반기를 든 손종섭(94)은 책 ‘이두시신평’(김영사 刊)의 20페이지를 글자 하나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는데 할애했다.
어릴 때부터 한학을 익힌 손중섭은 30년간 국어교사로 살았으며, 고희를 넘겨서야 고전 시가를 번역한 책을 다수 펴내는 등 국내 대표 한시 번역자로 꼽힌다.
다시 두보의 역작 등고 중 결구 해석으로 돌아가자. 저자는 ‘새로이 탁주 잔을 손에 든다’고 번역한다.
‘멈춘다’는 의미의 ‘정배(停杯)’를 술 마시는 동작 가운데 하나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정배’는 거배(擧杯·잔 들기)-정배(停杯)-함배(銜杯·잔 입에 갖다대기)-경배(傾杯·잔 기울이기)-건배(乾杯) 중 한 과정으로 잠깐 잔을 손에 들고 멈춘 순간으로 본 것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술을 끊는다’는 해석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은 “과거 사람들의 해석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고루한 풍조가 큰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감정을 느끼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신간 이두시신평은 이 한시 외에도 동시대를 살았던 시인 이백과 두보의 작품을 한글로 옮기고 부연과 평설, 평전, 연보 등 관련 자료를 두루 수록했다.
각 시인의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두 사람을 특색을 비교하는 재미를 곁들였다.
저자는 이백이 강렬한 감정대로 붓을 휘달린다면 두보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한다고 표현했다. 이백이 낭만적이고 때로 퇴폐적이기까지 하다면 두보는 사실적이며 인생에 충실하다고도 했다.
누구면 어떠랴. 한시사상 가장 빛나던 시기를 장식하며 시선(詩仙)과 시성(詩聖)으로 불리던 시인들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감동을 안긴다면 말이다. 값 1만7천원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