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전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독서문화사를 담은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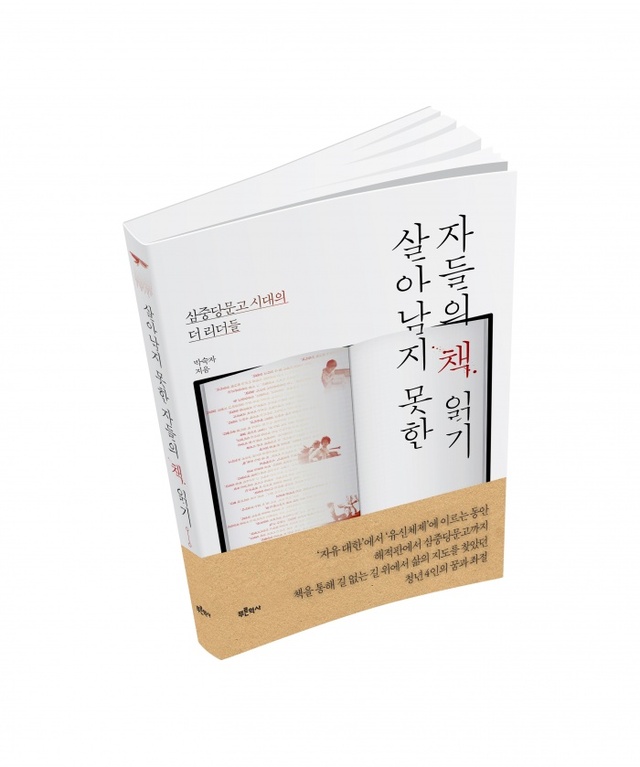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푸른역사 刊)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당시의 독서문화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풀어쓴 책이다. 근대 한국의 세계문학 열풍을 소개했던 <속물교양의 탄생>으로 신선함을 안겼던 경기대 박숙자 교수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번에는 ‘삼중당문고 세대의 독서문화사’를 부제로 내걸고 문학을 키워드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면을 파헤쳤다. 삼중당문고는 1970년을 전후해 나오기 시작한 문고본 중의 하나다. “가난한 고학생조차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책의 이름”이자, “그 시절 청년들의 꿈을 기억하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 시대의 문학과 현실을 읽는 ‘문학적 탐침’으로는 4인을 주목했다. 이념 과잉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최인훈의 소설 <광장>속 ‘준’, 혁명의 뒤끝을 앓아야 했던 김승옥의 소설 <환상수첩>의 ‘정우’, 스테디셀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쓴 ‘전혜린’(1934~1965), 인간다운 삶을 부르짖다 스러진 노동운동가 ‘전태일’(1948~1970) 등 소설 속 주인공 2명과 실존 인물 2명이다.
4명의 청년을 통해 “계통 없이 처먹던” 꿀꿀이죽부터 쥐잡기, 여차장 인권 소동, 무관심이 낳은 무등산 타잔 등 시대를 호출했다. 전태일이 왜 대학생 친구를 아쉬워하고, 세계위인전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식구인 듯 식구 아닌 식모는 어떤 의미였는지 굵직한 사회 문화 흐름을 짚었다.
다채로운 책, 영화, 시대의 사건들이 빼곡해 읽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슬픔이고 상처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무엇이고 국민이 누구인지 생각했던 전후세대, 1960년대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경험한 한글세대, 차별과 가난속에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던 여성과 노동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왜 신산한 그들을 독서문화사라는 부제 아래 현재로 부른 것일까. 서문에서 그 답이 드러난다.
“‘살아남지 못한 자’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들씌워진 가면을 잠시 벗겨낸 자리에 남아 있는, 아물지 않는 상처이다. 그래서 우리 삶과 역사는 그 상처와고통에 빚지고 있다. 살아남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일, 그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기억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저만치 놓인 이들의 삶을 다시 읽는 것으로 책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한다.” 값 1만4천900원
류설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