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년 999+1, 경기도의 思想과 思想家] 38. 강정일당-학문으로 일가를 이룬 조선 여류학자
가난 속에서도...학문을 꽃 피운...조선의 ‘여성 선비’
38. 강정일당-학문으로 일가를 이룬 조선 여류학자
조선 왕조는 여성이 공부를 통해 입신양명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과거시험을 볼 수도 없고 벼슬길에 나갈 수 조차 없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본인 재주를 사용할 곳이없었다. 그런데도 공부에 열정을 바쳐 학문으로 일가를 이룬 여성이 있었으니 강정일당이 그 주인공이다.

■ 가난한 부부
강정일당(姜靜一堂, 1772~1832)은 본관이 진주이며 충청도 제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강재수이며 어머니는 권서응의 딸이다. 정일당은 스무 살에 충청도 충주에 사는 14세의 어린 선비 윤광연(1778~1838)과 혼인했다.
조선후기에는 가난에 허덕인 양반들이 많았다. 정일당과 윤광연 부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모두 어엿한 양반가 후손이나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그래서 두 집 모두 혼수를 장만하지 못해 혼인한 지 3년 만에 겨우 정일당이 시집으로 갈 수 있었다. 이후 남편이 생계를 위해 지방을 분주히 오갔으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정일당 부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터전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에 계속 있는 것은 가난을 더 부채질하는 일이었다. 결국 생계 방편을 찾아 경기도 과천으로 와서 남이 버린 외딴 집을 빌려 새 출발을 했다. 정일당 나이 27세였다.
과천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남편은 서당을 열고 본인은 삯바느질을 했지만 수입이 좋지 못했다. “사흘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면서 호박 몇 개로 죽을 쑤거나 끼니 걱정을 할 때가 많았다. 이런 와중에 정일당은 자청해서 생계를 도맡았다. 남편이 학문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정일당은 수업료로 받아 두었다가 상해버린 고기와 밤으로 남편을 위한 끼니를 장만하고 두 닢으로 술을 사서 식사를 차렸다. 그러면서 “비록 적은 양이지만 얼마나 어렵게 마련한 음식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허기가 가시면 곧 공부를 시작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편지를 동봉했다.

■ 20대 후반에 시작한 공부
정일당이 학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27세 무렵이다. 이 해는 정일당 부부가 과천으로 옮겨온 해다. 낯선 환경에서 오히려 공부를 하겠다고 맘을 먹었으니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일당이 공부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학업 진도를 알리고 질문하고 토론했다. 어떤 날은 “그 동안 사서(四書)를 읽어 왔는데 ‘맹자’ 하권 3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당신에게 ‘주역’을 배웠으면 하는데 손님이 오래 머무르면 어렵겠지요”하면서 배움의 의지를 불태웠다. 또 남편 사랑방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강론이 열리면 어떤 책을 언급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록해서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틈틈이 해나간 공부는 점점 쌓여갔다. 남편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정일당에게 물어볼 정도였다. 공부의 성취가 많아지면서 남편 대신 글을 짓기도 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요청받은 글이 있으나 사정상 짓지 못하면 대신 써주었다. 스스로 “부인의 할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알까 두렵다”고 하면서도 글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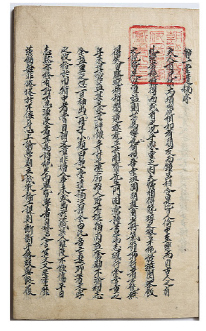
정일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실 중에 착한 것이 있으면 기록했다가 모범으로 삼았다. 그 중 정일당에게 큰 감명을 준 사람이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1721~1793)이었다. “남녀의 품성은 차이가 없고,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윤지당의 말은 생애에서 중요한 신념이 됐다. 본인의 당호 ‘정일(靜一)’은 남편이 붙여 준 것이다. 고요하게 하나에 집중한다는 의미대로 정일당은 그렇게 살았다. 정일당이 공부를 손에 놓지 않은 것은 자신을 수양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정일당은 “배워서 쓰지 않으면 당초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공부한 대로 마음을 수양했다. 심지어 바느질을 할 때에도 수양을 했다. 바늘로 옷을 꿰매면서 한쪽에서부터 다른 한쪽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작업했다. 바느질 하는 동안 잡다한 생각을 떨쳐내 정신을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었다.
정일당이 공부하면서 얻은 큰 결실은 가난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안빈낙도의 자세였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참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공부가 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정신의 기운이 화평할 때는 문득 춥고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을 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정일당이 시가로 들어온 날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가난이란 보통으로 있는 것이다. 언제나 운명에 맡기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정일당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따르고 공부로써 실천했다.
■ 술집에 들르지 마소서
남편이 정일당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일당 역시 남편의 학문 정진에 일조를 했다. 정일당 부부가 과천에 살던 시절에 이곳에서는 장사가 성행했다. 심지어 양반도 술을 팔았다. 문제는 마을에 술집이나 밥집 등이 있다 보니 남편이 술집에 드나들었다. 정일당은 남편이 한양 도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에 자주 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은 양반가로서 술을 팔고 있어 옳지 않다고 여기던 참이었다. 정일당은 남편에게 “당신이 손님과 함께 들른 것은 정말 우연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고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하면서 넌지시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남편이 날이 저물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했다. 그러자 남편에게 “날이 저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왜 박기제의 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주역』에서 음식과 술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술을 절제해 만사에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하고 짧은 편지를 보냈다.
정일당이 남편에게 바란 것은 오로지 학문의 정진이었다. 정일당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니 독서에 매진할 때입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일을 보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독서를 하십시오” 하였다.
또 ‘젊은 시절은 잃기 어려우니 각별히 노력해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젊은 시절을 허송해버린 사람들은 백배 노력을 더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편에게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남편을 깨치는 말이었다.
■ 공부의 길, 학문의 꿈
정일당은 평소 병치레가 많아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었다. 이런 좌절의 위기 속에서도 학문과 인격을 부단히 연마한 결과 남편의 스승으로부터 학자로서 인정받았다.
그렇다고 하여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다. 50세를 마감하면서 지은 시 한 수에서 평온하면서도 강철 같은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좋은 세월 하는 일없이 허송하고/ 내일이면 내 나이 어느덧 쉰하나/ 밤중에 슬퍼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남은여생 오직 내 몸을 닦을 뿐이리”<섣달 그믐밤>
이렇듯 정일당은 오로지 학문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아홉 자녀 모두 일찍 죽는 불행 속에서도 공부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끈을 놓지 말고 “이 길로 곧장 달려가라.”(<탄원 앞길은 편하고 튼튼해>)는 확신에 찬 정일당의 외침은 한 길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름답다고 일깨운다.
정일당은 생전에 3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지었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잃어버렸다. 다행히 남편이 남아 있는 글들을 모아 간행한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가 오늘날 전하고 있다. 묘소(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는 남편의 선영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에 있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