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사흘
시간에 담아낸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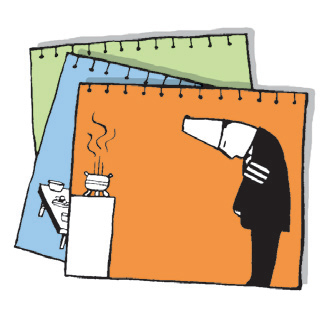
사흘
- 박지웅
문상객 사이에 사흘이 앉아 있다
누구도 고인과의 관계를 묻지 않는다
누구 피붙이 살붙이 같은 사흘이
있는 듯 없는 듯 떨어져 있다
눈코입귀가 눌린 사람들이
거울에 납작하게 붙어 편육을 먹는다
사흘이 빈소 돌며 잔을 채운다
국과 밥을 받아놓고 먹는 듯 마는 듯
상주가 사흘을 붙잡고 흐느낀다
사흘은 가만히 사흘 밤낮을 안아준다
죽은 뒤에 생기는 사흘이라는 품
사흘 뒤 종이신 신고
불속으로 걸어가는 사흘이 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다.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가 그것이다. 크로노스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개인의 노력이 투여된 특별한 시간이다. 크로노스가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운명적 시간이라며, 카이로스는 그 운명에 수(繡)를 놓는 정념의 순간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두 시간의 양상을 의인화해 신(神)으로 섬겼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막기 위해 자식들을 낳자마자 삼켜버린다. 시간에 의해 삼켜지는 것, 그것이 크로노스적 운명이다. 기회의 신으로 불리는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민머리다. 긴 앞머리는 기회를 뜻한다. 민머리는 기회를 못 알아보고 지나칠 경우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로 의미화된 카이로스는 한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희로애락의 특별한 시간이다. 하여 어떤 이에 대한 애도(哀悼)란 그 사람이 살았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정념의 표출이다.
시간의 의인화에는 친숙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함께 담겨있다. 애도의 시간도 그렇다. 박지웅 시인의 시 <사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의인화된 시간의 두 속성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함’이 감지된다. 시간을 인물로 의인화하지 않고 시간을 시간으로 의인화함으로써 얻어진 ‘사흘’의 특별한 시간은 크로노스적 운명과 카이로스적 정념의 세계에 애도의 시공간을 새로이 생기(生起)시킨다. 문상객 사이에 앉아있는 ‘사흘’은 시간의 동양적 의인화가 지닌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사이에 걸쳐진 ‘사흘’의 시간은 망자(亡者)와 산 자들의 정념이 뒤섞인 교집합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낸다. ‘사흘’이 빈소를 돌며 잔을 채우고, ‘상주’가 그 ‘사흘’의 말미를 붙잡고 흐느끼는 빈소의 삼일은 먹고, 안아주고, 흐느끼는 감정들의 북받침이 뒤섞여 하나의 ‘품’을 만든다. 그 품은 망자의 품이며 또한 산자들의 품이다. 그래서 두 품이 서로를 붙잡고 흐느끼는 ‘사흘’의 시공간은 깊고 애절하다.
죽은 뒤에 생긴 ‘사흘’의 품에는 설명할 수 없고 크기를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있다. 롤랑 바르트는 <애도일기>에서 “한 사람이 직접 당한 슬픔의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 했다. 박지웅 시인은 그 측정불가능의 슬픔을 ‘사흘’의 시간에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시 <사흘>은 읽는 이의 심정을 하염없이 울컥거리게 한다. 애도란 끝을 맺을 수 없는 감정의 흐느낌이다. 애도함으로써 죽음의 시간들은 깊고 따뜻해진다.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