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해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시선…송인관 시집 ‘적막 속에 나를 가둬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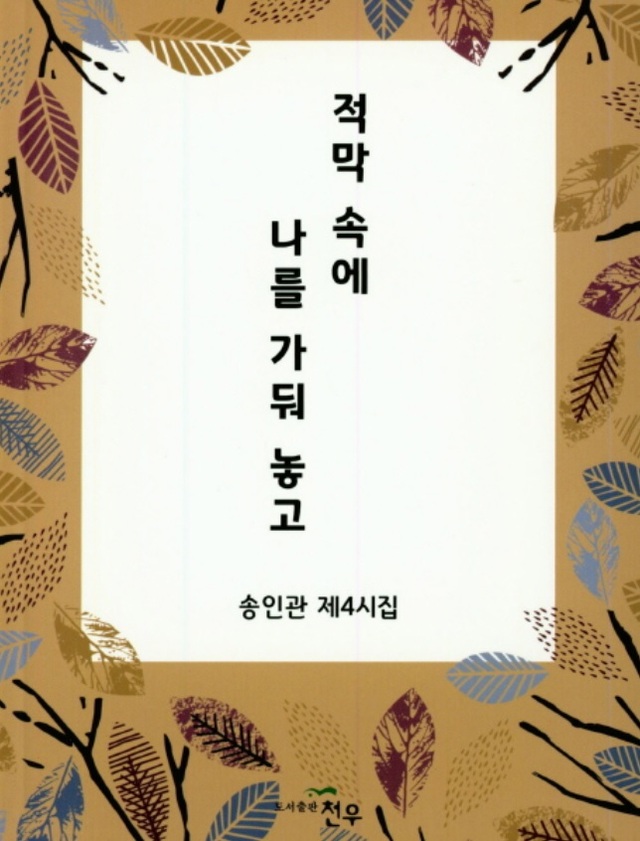
화려한 수사보다 담담한 삶의 말들이 더 힘 있고 울림이 클 때가 많다. 산해진미가 차려진 진수성찬보단, 따끈한 찰밥과 된장국이 놓인 소박한 밥상이 더 맛있기도 하다. 송인관 시인이 네 번째로 펴낸 <적막 속에 나를 가둬 놓고>(천우 作)는 소박하지만, 꿀맛인 밥상과도 같은 시집이다. 그렇다고 절대 쉽게 쓰인 시가 아니다. 문장마다 삶 속에서 건져 올린 단어가 자성이 담긴 목소리로 재탄생했다.
제1부 인생의 여울목, 제2부 삶이란, 제3부 흑백사진 한 장, 제4부 세월은 말없이 흐르네, 제5부 슬픔은 강물처럼 등 제5부로 구성된 시집은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삶과 인생을 저자만의 시어로 풀어냈다.
한평생 무명초같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만인을 위해 굵고 짧게/ 안중근 의사 같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다// 푸른 하늘 은하계에서/ 빤짝이는 무수한 별이// 검은 운석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듯// 타다 남은 촛불 같은/ 여의도 철새들//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지상에서 사라질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알고 있을까
시집에 담긴 ‘하느님은 알고 있을까’라는 시는 안중근 의사와 국회의원들을 대조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담았다. ‘자전거와 인생’에서는 자전거를 인생에 빗대 증오하지 않고 시원하게 달려가는 인생을 열망하는 작가의 사유가 담겼다. ‘흑백사진 한 장’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연민을, ‘단풍 든 나무’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인생을 수평선에 놓듯 바라보게 한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스한 눈길이 담겨 있다.
김전 문학평론가는 그의 시를 “시의 행간마다 사랑이 들어 있고, 인간애가 넘쳐난다”며 “시인의 삶이 곧 시”라고 평했다. 특히 “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되 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송인관 시인의 작품은 ‘자성과 삶의 진실성을 통한 서정시의 파노라마’”라고 정의했다.
저자는 1938년 과천에서 태어나 2010년 73세 때 수필, 2011년 74세 때 시로 문예지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했다. 과천문인협회 감사, 과천 율림문학회 회장, 문학세계문인회 정회원 등 고령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0회 문학세계문학상 수필 부문 본상,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예술문화공로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시인이 가는 길은 험난하고 외롭다.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내면의 세계를 확충하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여든을 넘긴 시인의 열정은 그의 시들과 어우러져 더 큰 울림을 준다. 값 1만 원.
정자연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