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빗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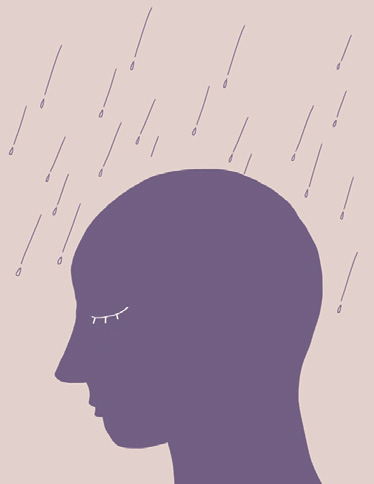
빗소리
- 장옥관
비 오시는데……
빗소리는 하염없이 쌓이고
또 쌓이는데
기차도 버스도 타지 않고
어떻게 찾아왔을까, 저 빗소리
몸도 없이
무작정 안기기부터 하는 바람처럼
빗소리……
제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어미처럼
소리는 풀죽은, 겁먹은 비를
지상에 서둘러 부려놓고
《그 겨울 나는 북벽에서 살았다》, 문학동네, 2013.
세상은 소리로 가득하다. 듣는다는 것은 수많은 소리들 중 어떤 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철학자 알폰소 링기스(Alphonso Lingis)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새들은 바람 부는 숲의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들 사이에서 지저귄다. 살아가는 과정은 사물들의 진동에 공명하는 과정이다.”(<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149쪽.)라고 했다. 그의 말은, 소리와 소리들이 부딪히며 공명하는 것이 곧 삶이라는 뜻일 터이다. 따라서 삶에 있어 절대고요란 없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조용하고 잠잠하다는 것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소리들 중 어떤 소리에 푹 빠져 다른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몰입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소리를 과학자들은 ‘백색소음(white noise)’이라 일컫는다.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 대부분이 백색소음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미로 사람을 얽매고 억압하는 ‘말소리’와는 결을 달리 한다.
시인들은 일찌감치 자연의 소리에 민감히 공명해왔다. 시를 문자로 표현된 백색소음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장옥관 시인의 「빗소리」가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들이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들 사이에서 지저귀듯이 장옥관 시인의 시에 내리는 빗소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도망가는 어미의 소리 속에서 하염없이 쌓이고 또 쌓이며 애절의 소리를 지상에 한 짐 부려 놓는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를 ‘저 빗소리’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제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어미”의 심정처럼 ‘겁먹은 비’만 덩그러니 지상에 남겨놓고 사라지는 소리. 그것은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소리이게 하는 삶의 원초적 공명일 것이다. 기쁨과 슬픔이 공명하고, 나와 다른 이가 공명하고, 삶과 죽음이 공명하고, 하늘과 땅이 공명하면서 내는 백색소음이 바로 장옥관 시인의 시에 내리는 빗소리다. 그걸 듣는 나의 귀에 종일토록 비가 내린다.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