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과연 이름 그대로 ‘안락’사일까
회복 가망 없는 중환자
고통 덜기 위해 생명 단축
23년 만에 호전된 사례도
‘기적’은 실현될 수 있어…
생명 포기 않는 세상 기원

윤리 의료 문제로 깊이 있게 토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안락사’다.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존엄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삶의 희망이 없고 고통뿐인 삶을 인위적으로 끝내주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존엄사의 의미인가? 그렇다면 만약 그 안락사의 대상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라면 어떨까?
뇌사란 ‘의학적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 회복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뇌사자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생명을 유지할 능력조차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또 만약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뇌사자의 목숨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대답에 앞서 뇌사상태를 회복한 사례들을 알아보자. 벨기에의 한 남성은 뇌사판정을 받고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미동의로 23년 동안이나 병실에 누워지냈다. 그런데 이 환자는 23년 후에 키보드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언론 인터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이것을 단순 의료과실로 보았었지만 이 환자는 처음에는 명확하게 뇌사상태였음이 밝혀졌고, 상태가 점점 호전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으로 볼 때 뇌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뇌사상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이런 자를 다른 이가 안락사로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릴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시와 같이 뇌사자가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이 기적이었든 무엇이었든 뇌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모순되는 사례였던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만들어보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인격체에게 살인이 될 수도 있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다. 물론 뇌사상태에서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며, 그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또한 만약 그 기적이란 단어가 그 뇌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식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시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현상을 병실에 지속해서 눕혀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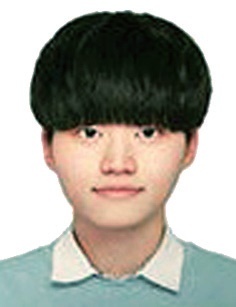
하지만 남겨진 가족과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그들은 그 확률을 포기할 수 있을까? 비록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들어가는 물질적인 소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이 질문에 따른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염두로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인을 선택한 것과 동등한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살인의 가능성이 있는 안락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주변 이들의 동요에 흔들려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
성남 성일고 이동석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