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치열한 사회 속 지쳐가는 청년들... 기성세대의 이해·위로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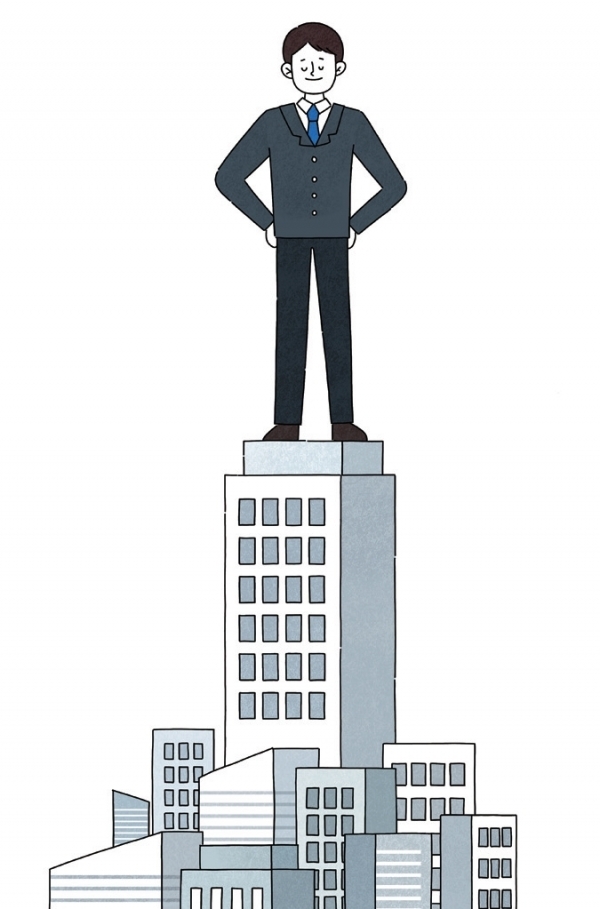
강희맹의 ‘세 아들의 등산’과 정약용의 ‘유산으로 남기는 두 글자 근과 검’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즉 성실과 노력은 아직까지도 기성세대들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훈수를 둘 때 꾸준히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성실과 노력을 중요시 해왔다. 이러한 관습은 대대로 이어져 왔고 아직도 성실과 노력이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믿는 어른들이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오늘날 청년들에게 강희맹과 정약용의 글은 영양가 없는 훈수로만 보인다. 지금의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적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이다. 부모 경제력으로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고, 계급이 된다는 수저 계급론은 이러한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예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출발점부터 하늘과 땅 차이인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비롯된 거리 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다. 이 거리 차를 좁혀 줄 해결방안은 절대 청년들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해야만 조금 개선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삶에 치여 하루하루를 치열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조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럴수록 세대갈등은 깊어지고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제, 불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성실과 노력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흘렀고,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사회에 불만을 토로하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성실과 노력 맹신론’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실과 노력이 아니라 청년들의 애환에 대한 기성세대의 이해와 작은 위로라고 생각한다.
황지영 고양 대화중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