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선거에 소환되는 ‘노벨 경제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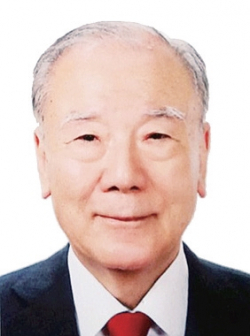
미국에서 오랫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언론계 인사와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는 아들의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미국에서는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회에까지 나갈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주 엉망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방법과 해답을 중시하는 한국식 교육내용의 차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1등이 한국에서도 1등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다 창고 하나를 빌려 창업을 했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 그런 과정을 거쳐 창업했어도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정보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정부의 규제에 갇혀 있는 한국에서는 학원 강사나 카센터 사장에 머물렀으리라 예측하기도 한다.
나라와 나라의 문화뿐 아니라 학문과 현실 사이에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노벨상을 받은 마이런 숄스와 로버트 매튜 두 사람이 노벨상금과 개인 재산을 투입, LTCM이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세웠었다. 많은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MIT 등, 명문대 교수여서 이들 투자금융회사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회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1천2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밖에 악재에 시달리다 파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렇듯 경제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예측할 수 없는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우리나라에 소환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지사가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와 에스더 뒤플로(Esther) 이론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석이 왜곡됐다’, ‘그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용돈 수준이다’ 등등….
재반격을 가하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긴 X-파일까지 난무하는 세상이니 자기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를 끌어들이는 심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까지 선거에 이용하려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씁쓸하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진정성과 확신에 차있다면 굳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세운 회사도 망하는 법인데.
변평섭 칼럼니스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