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시대의 인권을 말하다 '문화와 폭력', '깻잎투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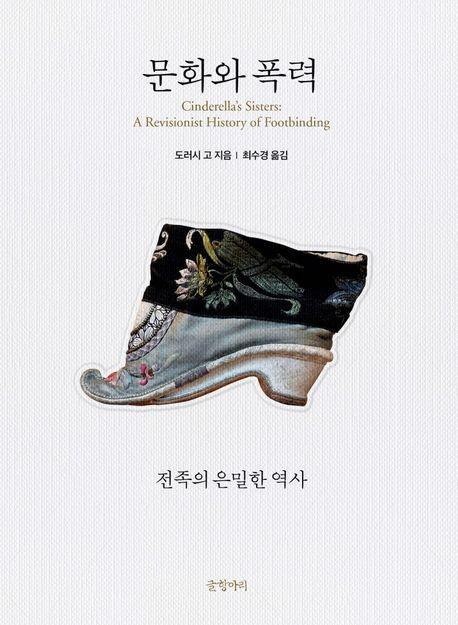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 인권이다. 여기 두 시대를 통해 고민해봐야 할 인권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삶,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오래 전 막을 내린 중국 여성의 ‘전족’에 여성의 욕망을 해석해낸 이야기다.
■ 문화와 폭력-전족의 은밀한 역사(글항아리 刊)
큰 발은 천하고 작은 발이 귀하다는 인식에 중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발을 동여매야했다. 헝겊 등으로 여성의 발을 동여매는 ‘전족(纏足)’은 중국에서 12세기부터 수백년간 이어진 끝에 20세기 들어 ‘반(反)전족 운동’으로 끝이 났다. 1957년의 일이다.
대체 어떤 강력한 힘이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전통적인 관습으로 만들었을까. 전족이 사라지자 많은 연구자가 전족을 여성에 대한 억압, 인권 무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전족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명·청 시대 연구자인 역사학자 도러시 고는 ‘문화와 폭력-전족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 주류로 이어져 온 ‘전족 담론’을 뛰어 넘어 색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다룬다. 바로 ‘전족 여성’의 시각이다. 저자는 전족 여성을 직접 만나 근대 반전족 운동 기간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느낀 굴욕감과 선택 동기, 갈등 등을 보여준다.
저자는 전족이 ‘작은 발’을 탐하는 남성의 욕망에 의해 추동되고 이어져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지만 강요된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남성의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작은 발을 일종의 ‘패션’으로 인식하며 이를 성공 수단으로 여겼던 여성들의 욕망도 있다는 것. 그동안 전족을 다룬 논의에서 ‘매몰된 주인공’이었던 전족 여성들의 욕망과 목소리도 찾아내 들려준 점이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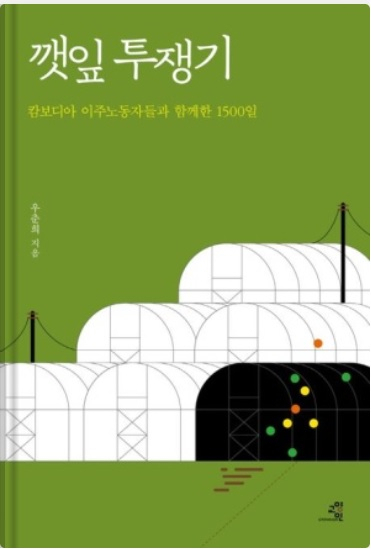
■ 깻잎투쟁기(교양인 刊)
깻잎은 과거에는 노지 밭에서 키웠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1년에 두 번 파종하는 이모작 방식으로 키운다. 병충해에 강해 쉽게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면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깻잎은 누가 다 키워냈을까. 어느 정도 자란 잎사귀는 어떤 손으로 하나씩 직접 따내 우리 식탁까지 오는 것일까?
식탁에 오르는 깻잎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기계적 노동을 통해 재배되고 있다. 깻잎투쟁기는 연구자이자 현장활동가인 우춘희씨가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장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한 투쟁기다.
깻잎뿐만이 아니다. 고추, 토마토, 딸기, 계란, 김, 돼지고기 등 우리 밥상에 오르는 매일의 먹을거리는 낯선 환경으로 넘어온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로 이미 텅 비어버린 농촌의 일터는 이주노동자의 땀이 대신하고 있다. 전체 농·어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이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단순히 이주노동자의 값싼 임금, 환경만을 말하지 않는다.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해준다. 저자가 전하는 이 몇 마디는 그래서 울림이 크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