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마스크 일상’ 감염병 줄고… ‘소통 단절’ 우울증 늘었다
병원 비대면 진료...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 병실 카메라·투명벽 등 실시간 모니터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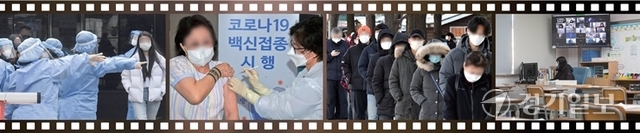
코로나19 3년 동안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명과 암’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선 미접촉 진료 등 새로운 의료체계가 도입됐지만 비대면으로 인해 정신건강엔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과 호흡기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선 환자와 의료진이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호흡기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춘택병원은 그해 4월 비대면 진료 방식을 도입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전화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면 의료진은 그에 맞는 처방을 한 뒤 약을 배송하거나 약국에 처방전을 넘겨 보호자가 찾아갈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00여명의 환자가 의료진을 접촉하지 않고 진료를 받았다.
중증환자를 돌보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도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빠른 진료를 위해 병실에 카메라와 투명벽을 설치하고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며 “비대면 진료와 미접촉 모니터링이 어색했지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또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감염병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초반인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02만6천8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669만5천341명)보다 51.9%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마스크와 비대면 생활에 갇힌 3년간 소통 단절은 심각해졌고 이에 따른 우울감은 커졌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3.2%에서 2022년 18.5%로 급증했으며 코로나 이전보다 자살 생각률은 4.6%에서 11.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 1년째인 2021년 3월엔 22.7%로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생활을 선호하게 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등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살펴보면 1인당 택배 이용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5.1박스에서 2021년 70.3박스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민이 한 주당 1.4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택배나 배달음식 등 다양한 포장재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2만t(2019년)에서 2020년 441만t으로 2배를 넘어섰다.
전문가 제언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코로나19 시대가 이어진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날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으며 한 달 후엔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올라섰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각종 방역조치도 등장했다. 코로나19 3년을 맞은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코로나19를 받아들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감염병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 정부와 지자체 등 분야 구분 없이 모두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3년을 거치며 의료계 역시 많은 변수가 생겼다. 이젠 코로나19의 부담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료 시스템을 만들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령, 재원, 사회적 체계 등 많은 것이 바뀌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채 일상 속에 질병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금 이 시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일상화를 거치면서 기술 등이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화 등 취약한 부분도 발생했다. 특히 사람 간의 관계 맺기는 대면으로 형성되는데 감염병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이를 놓치기도 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당장 사회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아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생활을 재해석하고 완연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서로 배려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것들은 정부, 지자체 등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