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상승했지만 통계 허점… 수요 맞춤 정책 ‘시급’ [이슈M]
청년 실업자 늘고, 1인 사업자 급증... 기대수명 증가로 퇴직 후 취업 원하는 중장년층↑ 道 인턴근무 지원·인천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 등 상당수 단기·임시형 일자리… 질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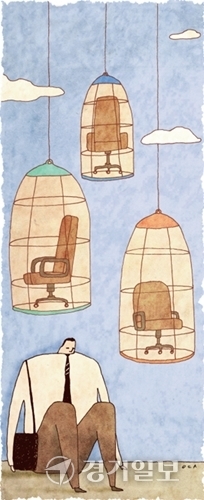
경인지역내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각종 일자리 관련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인지역의 고용률 만을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의 허수’가 존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요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경인지역의 고용률은 수치상으로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고용률은 2020년 60.3%, 2021년 61.1%, 2022년 63.9%이며 인천지역은 2021년 59.0%, 2022년 59.8%, 2023년 61.4%로 상승세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률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경기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2020년 43.1%, 2021년 45.5%, 2022년 50.0%까지 상승했지만, 이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1인 청년 사업가를 포함한 수치다. 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1인 사업에 나선 청년층의 수를 따로 살펴보면 2019년 39만4천152명에서 2020년 43만9천698명으로 급증했고, 청년 실업자 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 2022년 21만5천명, 2023년 24만7천명으로 3만여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개인 활동을 보장 받는 프리랜서로의 삶을 택한 청년들까지 고용률에 포함되면서 마치 전반적인 청년 고용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인천시의 청년 고용률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것 역시 같은 이유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해도 단기 일자리 등 프리랜서를 선호하면서 1인 사업자를 제외한 청년고용률은 2021년 4분기 48%에서 2022년 1~3분기 52.4%로 올랐다가 2022년 4분기 51%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와 인천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면 대부분 청년 채용시 기업에 인건비를 주는 지원금 등에 한정돼 있다. 청년 수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은 모의면접, 그룹팅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도내 청년 중 고작 306명만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을 뿐이다.
인천시 역시 종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사업에 한계를 느끼고 최근에서야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사업 편향 기조가 청년들의 장기 재직이나 지역 정착 등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 같은 통계의 허수는 중장년층 고용률에서도 나타난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경기지역의 중장년층 고용률은 2020년 74.4%에서 2021년 75.6%, 이후 2022년 78.1%로 증가했다. 인천지역 중장년층의 고용률 역시 2020년 75.4%, 2021년 76.3%, 2022년 77.6%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기형, 임시형 일자리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은 전무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50~64세를 대상으로 ‘인생2막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정 수입이 생기는 일자리 사업이라기 보단 사회공헌 활동에 가깝다. 냉난방기 수리 교육을 익히고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방문, 수리해주면 도에서 일정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정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도는 3월부터 40세 이상 64세 250명를 대상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아 3개월 인턴 근무 지원 사업을 펼친다. 3개월 기업에서 인턴 후 정규직 전환,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턴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할 수 없다.
인천시의 경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1년 단기계약에 그친다. 또 직업 분야 역시 돌봄, 원예, 정원관리사 등 진입장벽이 낮고, 사회복지 분야에 치우친 탓에 중장년이 본연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원하는 일자리에 비해 정책이 한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일자리의 경우 여러 의견을 반영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제언 “개인 특성·역량 집중... 세밀한 일자리 확장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수요와 역량에 맞는 꼼꼼하고 세밀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청년층은 구직 시기도 늦고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신체 나이가 (정년퇴직 시기에 비춰) 늦춰지고 있다”며 “특히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군도 변했고, 사라지는 직종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 능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연령, 나이로 일자리를 구분하는 ‘일자리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세밀한 일자리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단순히 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저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과 취업자 모두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일자리 위주가 아닌 사회 변화와 구직자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면서 “유관기관이 나서 직업 특성 교육, 기업 매칭 서비스의 체계화 등을 마련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