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水 없는 ‘배터리 화재’… 소화 장비 태부족
소화수조·덮개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장 比 진압 장비 턱없이 적어 물로 소화 땐 2차 폭발 발생 우려... 도 소방재난본부 “대책 검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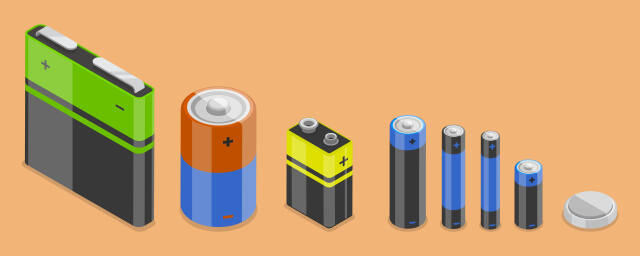
배터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 배터리 화재 시 진압을 위한 장비인 ‘소화수조’와 ‘질식소화덮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차전지의 경우 화재 진압 시 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명확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는 재충전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차전지와 재충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분된다. 두 전지 모두 화재 시 온도가 순식간에 1천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물로 진화가 어려워 빠른 초동 대처를 위해선 통상적으로 소화약제와 소화수조, 질소 덮개를 사용한다.
군이나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차전지 리튬 배터리는 양극으로 사용된 리튬 또는 리튬 혼합물로 인해 화재발생 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가연성가스인 수소가 발생해 2차 폭발을 가져올 수 있어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부차적으로 덮개 등을 사용해 진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기차, 스마트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과의 반응성이 없어 물을 이용해 소화해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조에 담아 냉각소화하거나 불연포를 덮어 소화를 하게 된다.
문제는 도내 일차전지 또는 이차전지 등 배터리 제조 사업장이 20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 중 88곳이 일차전지 제조 사업장인 가운데 도내 소화수조와 질식소화덮개(올해 6월 기준)는 각각 37개, 80개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 규모로 모든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모든 일차전지에 적응력이 있는 소화약제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다. 또, 이 같은 진압 장비들은 소량의 배터리 화재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화성 아리셀 공장처럼 여러 개가 쌓여 있어 연소가 확대된 경우 마땅한 대비책도 없는 실정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량의 배터리 화재 시 작은 불이면 수조나 덮개를 이용해 폭발을 막을 수 있지만 소방마다 소화수조나 덮개가 부족한 수준이라 일반인들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현재 화성 화재처럼 일차전지 공장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과 함께 진압 장비 확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진압 장비 확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