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팔꿈치터널 증후군 증상과 치료
팔꿈치 구부릴 때 척골신경 눌려서 약지·새끼손가락 저리고 힘이 빠져
심한 경우 수술 통해 적극적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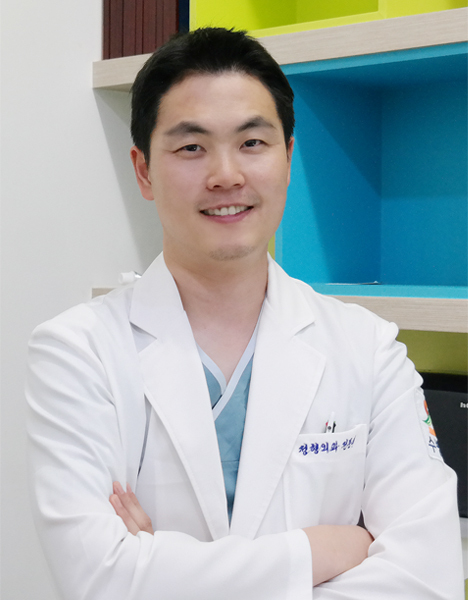
팔꿈치터널 증후군이란 상지에서 손목터널 증후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며, 주관절(팔꿈치)을 펼 때 보다 구부릴 때 척골신경(ulnar nerve)이 눌려서 발생한다. 팔꿈치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나, 염증, 반복되는 척골신경의 아탈구(불완전 탈구)로 인한 마찰, 척골 신경이 과도하게 꺽여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팔꿈치 안쪽의 튀어나온 뼈에 염증이 생기는 내상과염과 동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게는 50대 남성과 여성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운전과 같이 팔꿈치를 구부린 채 일을 하는 젊은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원인으로는 급성 외상이나 주관절 내 종양,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뼈가 자라나는 골극, 내상과의 부정유합 및 불유합, 비정상적인 근육의 존재 등이 있다.
증상은 초기에는 가벼운 손 저림의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다른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으로 오인하여 한방요법, 혈액순환 개선제 등의 치료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병이 진행될수록 약지 및 새끼손가락에서 저린감, 팔꿈치 내측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 젓가락을 놓치거나 단추 끼우기 등이 어렵게 되는 등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근육 침범이 진행된 경우에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근육이 말라보이거나, 약지 및 새끼손가락의 변형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은 병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검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학적 검사(환자의 팔꿈치를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검사, 팔꿈치 구부릴 때 저린감 호소, 약지 및 새끼손가락의 감각 저하) 와 전기적 검사(근, 신경 전도 검사) 가 있다.
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발생한지 오래 되지 않은 환자인 경우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 보존적 치료란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거나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야간 부목 고정을 실시하고 운동요법, 자세교정으로 운전·취침 등 일상 생활 시 팔꿈치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여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약을 먹거나 팔꿈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주사는 환자에 따라서 진단 또는 증상 회복을 위해 맞을 수는 있으나 척골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 특히 팔꿈치를펴는 자세를 많이 취해도 저린감이 지속되거나, 제 1 지간공간(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위축이 있어 병이 진행된 경우, 종양이나 반복적인 신경 탈구가 있는 경우, 어렸을 때 팔꿈치 주위 골절이 있는 경우, 팔꿈치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개 보존적 치료로는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수술적 치료가 권장된다.
수술적 치료는 단순 감압술과 전위술이 있으며, 단순 감압술은 좁아져 있는 팔꿈치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열어주는 수술로 팔꿈치 주위 6센치 정도의 절개 창을 통해 척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열어준다. 종양이나 반복적인 신경 탈구, 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경을 피하 전방이나 팔꿈치 근육 아래 또는 근육내로 전위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한다. 수술 후 예후는 병의 진행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으나, 진행된 경우에는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재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병의 진행이 되기 전에 전문 의료진을 만나서 미리 예방을 하거나 힘이 빠져서 손가락 사용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민 수원 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