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 온 마이클 샌델…'공정하다는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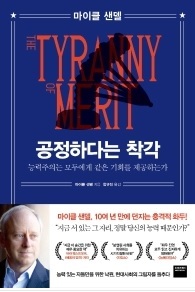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정의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등의 저서를 통해 꾸준히 정치ㆍ윤리철학을 논해온 바 있다. 그의 저서 중 상당수가 고리타분한 철학 이론, 사상이 아닌 우리 삶 속 실제 사례와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음을 던져 더욱 사랑받아 왔다.
마이클 샌델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와이즈베리 刊)도 6개 챕터에 걸친 사회 속 사례를 통해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고찰한다.
이번 신간은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음을 알린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물론 ‘공정함=정의’라는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대표적인 사례로 샌델은 수업 중 가상 속 두 나라를 사례로 들었다. 둘 다 재산과 소득면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이 아닌 각자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이는 사회라면서도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느 사회가 더 낫거나, 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아울러 샌델은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통계를 조사, 인용했다. 그는 SAT가 사회ㆍ경제적 배경과 무관한 타고난 지능이나 수학능력을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 집안의 부와 연관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말한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가정의 자녀 중 1천600점 만점에 1천400점 이상 기록한 수치는 20%에 달하나 연소득 2만달러 이하 저소득 가정 자녀는 그 수치가 2%에 불과했다. 고득점자들은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샌델은 수업에서 학생들을 향해 던진 질문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말한다.
이번 신간은 ‘노오력’은 기본이고 열정과 운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운, 노력, 공정함, 정의 등을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값 1만8천원.
권오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