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경찰개혁] 1. 대변혁 맞이한 경찰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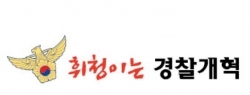
경찰 조직이 사상 최대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67년 만에 이뤄진 검경 관계의 변화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이다. 달라진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다소 폐쇄적인 검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며 균형을 맞춰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내며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대변혁을 맞이한 경찰, 그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을 ‘국민체감 경찰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께 보이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 변화를 앞둔 장(長)의 결심이자, 조직에 대한 당부였다.
그러나 경찰의 행태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과 막중해진 책임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수사 종결권 확보에 따른 변화에 앞서 본연의 임무조차 완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구분되는 경찰 고유의 임무는 ‘초동 조치’다.
지난 2월 광명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임무 수행은 허술, 그 자체였다. 50대 남성 A씨는 지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당일 경기남부경찰청 112상황팀 요원은 B씨의 신고를 접수, 가장 위급한 상황에 이뤄지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정작 B씨가 ‘A씨의 집’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누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경력 21명은 A씨의 집 근처를 50분간 헤맸고, 그 사이 B씨는 잔혹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사건 당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112상황팀장 H 경정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전망이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징계위 판단에 달렸지만, 중징계 처분이 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경찰들도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당시 경찰청은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이해충돌 방지’도 무시했다.
광명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난 2월 경기북부에선 경찰 간부의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L 경감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L 경감의 20대 아들은 SNS상에서 65억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를 자랑하며 사업 파트너를 모았지만, 모두 사기였다. 고소가 제기되자 돌연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포천서에 접수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뒤늦게 재수사를 결정, 감찰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엄중 조사’를 약속했지만 3개월째 진척이 없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나, 감찰 책임자 J 총경이 ‘무슨 자격으로 상관을 가르치려 드느냐’는 취지의 답글을 써 되레 논란의 불씨가 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수준은 높아지는데, 일선 경찰들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하거나 사건에 개입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휘부에서 개혁 원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부 조직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로운 힘이 주어진 만큼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