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집을 말하다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며 화제다. 내용이 언뜻 제목만으로 건축에 관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나 첫사랑의 추억을 집 짓는 과정에 담았다고 한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삶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집과 관련지어 가능하다 하겠다. 개항과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서구의 건축문화가 들어오게 된다. 외국인이 그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어야했고 호텔과 교육시설, 기독교 종교시설이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축문화가 들어왔다.
이 무렵 서울 대부분이 초가집이었다. 개항 뒤에 새로운 문물에 자극을 받은 개화파 지식인들은 불편한 기존의 집을 바꾸고자 했으나 당시 사회,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1920년대부터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커지고 그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동네에 ‘도시형 한옥’이 들어서게 되었다. 옛 모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추어 일부를 개량해 지어 주택 개발업자가 일종의 상품처럼 대량 공급한 주택이다.
그러나 도시형 한옥은 한옥의 기본 요소와 뼈대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생활의 큰 변화보다 전통양식을 지속시킨 편이었다.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도시주택은 바로 이 ‘도시형 한옥’이었다.
중산층을 위한 집이었던 도시형 한옥과 달리 ‘문화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이 이름은 ‘문화주의’가 한창인 일본에서 들어왔다. 주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가 만든 고급주택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던 친일인사를 비롯한 조선인 상류층과 일본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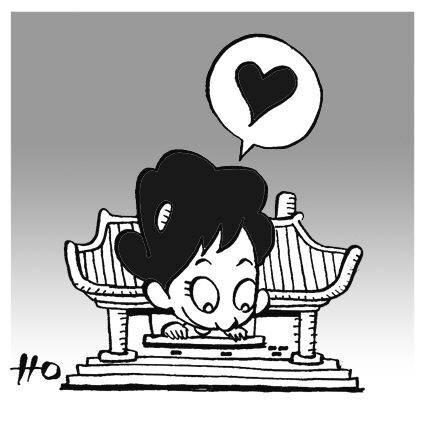
재료에서도 시멘트, 타일, 페인트 등 그 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썼으며 주로 2층이었다. 아파트는 일본인이 노동자를 위해 지은 집단생활을 위한 기숙사 형식이 시작이며 우리나라 도시형 아파트의 원형이다.
1930년대 미쿠니(三國)아파트와 유림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잡지나 여행기 번역문 등에서 근대적인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주거로서 아파트를 소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 외래어인 아파트가 낯설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토를 잃거나 농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도시로 몰리며 이들은 셋방을 얻어 살거나 행랑살이를 해야 했다. 그마저도 안되는 사람들은 묘지, 강바닥, 다리 밑 등에 토막(土幕)을 짓고 살았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으나 동네 사랑방 같은 ‘복덕방’이 부르기 익숙한 세대가 많을 것이다. 복덕방은 한자어인 가쾌나 ‘집주름’이라는 우리말을 썼다. 집주름은 동네 사정을 잘 안다는 뜻으로서 이들은 한 동네에 오래 살면서 집집의 속사정까지 잘 아는 노인들이었다.
그것이 경제활동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복덕방이 ‘복 있는 집으로 안내하는 방’이라니 매우 인간적이고 정이 가는 말이라 하겠다.
정상종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