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중독조직의 최후

이런 경우 사기, 기만, 협잡, 무책임,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같은 생존을 위한 증상들이 조직과 사회를 황폐시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이 같은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이 같은 현상을 중독조직이라 칭한다.
불행하게도 주변에서 중독조직을 목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들은 중독조직이란 책에서 한 폐쇄적 수도원의 알콜중독자인 원장의 독단과 부정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동반중독자들이 생겨나고, 수도원 전체가 중독조직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술하여 결국 중독조직의 원인은 독단적 폐쇄성과 리더의 윤리적 인식의 결함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한다.
또 리더의 중독을 덮기 위해 앞장서는 동반중독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을 조직의 생존을 위해 앞장서는 희생과 헌신의 봉사자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껏 ‘정상’이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은폐해 온 조직의 문제들은 사실 ‘중독’이라는 이름의 병리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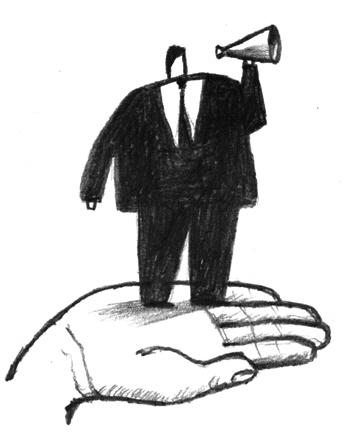
새프와 패설은 중독조직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먼저 리더와 조직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중독을 벗어나려는 교육의 과정을 거친 후, 조직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 회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의 방식, 상호 의사소통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방식, 각각 분권화된 경영을 가능케 하는 리더쉽의 방식을 통해 조직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느리고 오랜 시간을 전제한다. 통합적이고 유기적 시스템속에서 효율화된 기능을 하게해야 한다.
중독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인재가 떠난다는 것이다. 중독된 공공기관을 가려내는 것은 지자체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차재근 경기문화재단 前 문화예술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