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양성평등, 양과 질 함께 논해야

그러나 이 법의 명칭이 바뀌고, 각 지자체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약간의 혼선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의 범주를 해석함에 있어 이전 법에서는 여성만이 정책대상이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를 모두 정책대상으로 보는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한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고 있는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남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거나, 양성평등의 의미를 남녀 간의 기계적인 평등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둔 채 남녀의 양적 비율에 대한 고려와 남성의 참여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애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도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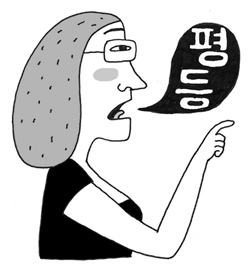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건강, 교육, 경제 측면에서 발표한 한국의 남녀개발지수(GDI) 역시 전체 161개국 중 104위이다.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 낮은 정치적 대표성, 성별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지수들이 여성의 현황을 다 말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분명하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그러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계적 참여가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 속속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차별에 보다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히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의 평등일 것이다.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