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점심 유감(點心 遺憾)

여행 도중 저잣거리에서 만난 노파가 그에게 제안한다. 당신께서 금강경에 정통하다하니 질문에 잘 답변하면 점심을 대접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밥을 굶어야 한다 했다. 노파가 묻는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했는데 스님은 점심―곧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주금강’이란 찬사를 듣던 덕산 화상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물론 점심도 얻어먹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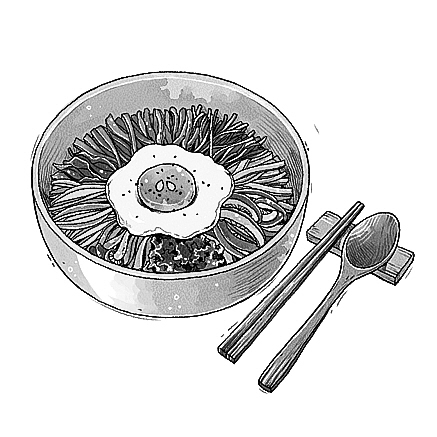
피로와 출근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른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재충전을 위한 황금의 시간이다. 그런데 실상 어떤가. 사람으로 붐비는 직장 주변의 식당이 아니라 교외에서 한적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즐길 겨를이 없다. 한 시간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어렵다.
현대인들은 시간적 약자요, 소수자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시간성 같은 형이상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제 점심이라는 ‘골든타임’을 누릴 수 있도록 12~13시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관행과 정책을 바꿔볼 시점에 왔다.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복지의 개념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점심식사 시간을 30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인 토론을 붙여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퇴근 시간 30분을 연장하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한국에서 오후 6시에 정시퇴근을 하는 간 큰 직장인과 공무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유럽처럼 점심시간을 2시간을 주거나 시에스타 같은 라틴 문화는 바라지도 않는다. 시간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사 시간 30분을 연장하는 ‘점심이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봄직하다. ‘경기’도 살리고, 업무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성면
문학평론가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