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참 기자 ‘염상섭’의 수원 화성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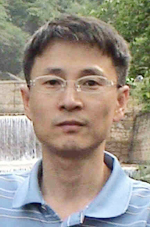
또 축성의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건축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니 문화예술인들의 화성에 대한 유별난 편애는 별로 놀랄 일은 못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95년 전 1922년 9월 3일 놀랄 일이 아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수원 화성을 한국문학 대표작가인 횡보 염상섭(1897~1963)이 찾아와 한 편의 방문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이 글이 횡보 염상섭의 ‘구 7월 1일 오전 5시 탁랑(濁浪)에 해백(駭魄)된 수원 화홍문’이란 수필에 대한 사상 최초의 발굴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다.
당시 횡보는 게이오대학 사학과를 중퇴하고 육당 최남선(1890~1957)이 주재하던 주간지 ‘동명’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소설사에 길이 빛날 명작 ‘만세전’ 발표를 끝마친 참이었다. 그러니까 ‘탁랑에 해백된 수원 화홍문’은 떠오르는 신예작가이자 전도유망한 주간지 기자였던 횡보 염상섭의 수원 화성 탐방기이자 감상문인 셈이다. 횡보의 수필은 다음과 같이 깊은 장탄식으로 시작된다.
“水城(수성)이 아니라 ‘愁城’(수성)이요 華山(화산)이 아니라 ‘禍山’(화산)이라는 民謠(민요)가 있을 만치 規模(규모)의 大(대), 營建(영건)의 精(정), 景槪(경개)의 美(미)를 모아 뒤주大王(대왕)의 怨靈(원령)을 받들어 위로하고 人子(인자)의 誠(성), 爲親(애친)의 道(도)를 다하고자 國力(국력)을 기우려 經之營之(경지영지)한 옛날의 華城(화성), 오늘의 水原(수원), 그中(중)에도 ‘華虹觀漲’(화홍관창)의 勝景(승경)은 가엾게도 인제는 지난 밤 꿈이 되었고나. 자랑이 極(극)하면 敗(패)하나니 華虹(화홍)은 그 觀漲(관창)으로 이름이 높았는지라, 이제 다시 그 怒漲(노창)으로 駭魄(해백)됨이 또한 自然(자연)의 數(수)라 할까.”
짤막한 수필이지만, 약관 25세의 나이에 수원 팔경 및 붕당사 등을 훤하게 꿰뚫는 풍부한 교양과 횡보의 작가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글에 담긴 메시지가 불편하고 어둡다. 그렇다. 횡보의 수필은 임술년(1922) 7월 1일 새벽 미증유의 집중호우로 일곱 개의 수문 석축만을 남긴 채 문루가 휩쓸려 내려간 화홍문을 취재한 글이었던 것이다.
빼어난 건축미와 풍광으로 대한제국 국폐(國幣)의 도안으로 쓰이던 화홍문은 물론 남수문까지 이 날의 수마로 모두 유실되는 아픔을 겪는다. 처참한 광경에 횡보는 탄식해마지않았지만, 수원을 한양 다음의 아경(亞京)으로 자부했던 수원군민들이 떨쳐 일어나 화홍문 복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당시 수원의 유지였던 차재윤 등 수원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기도비가 더해져 수해를 입은 지 꼭 10년만인 1932년 5월 화홍문이 낙성, 복원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홍문은 85년 전 수원군민의 힘으로 복원된 화홍문이다. 한동민 박사의 말대로 이는 “우리 문화사에 남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모범 사례”이자 쾌거였다.
수원 화성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높은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횡보의 화홍문 방문기는 후일 국어학자 환산 이윤재(1888~1943)가 펴낸 ‘문예독본’(1931)에 수록, 해방공간기에서도 문학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탁월한 조상들이 탁월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그 문화유산과 역사가 다시 훌륭한 후손과 시민을 만들어낸다는 문화의 철리를 화홍문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조성면 문학평론가·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