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화려한 포장과 내용의 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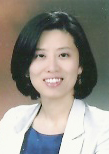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켜보면 가끔 명절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받는다. 발표 자료도 멋지게 작성했고 발표자의 태도도 자신감이 넘치면서 또박또박 말도 잘 한다. 더구나 국어국문학과 학생답게 구사하는 어휘도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어려운 한자어나 개념어, 전문어 등을 무리 없이 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
어려운 말을 구사하며 화려한 발표 자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발표 내용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빌려와서 적당히 잘 꿰어 맞춘 것일 뿐이고 자신의 고유한 견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말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온전히 내용을 이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당연히 평가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학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같은 경우가 있었다. 학회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모임이다.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 토론자는 논의의 타당성이나 유용성, 문제점, 의의 등을 짚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논문은 부족한 논리를 채우고 모순이나 표절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논의로 해외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기에 그 이론들이 적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한국어 예에 대한 설명은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았다. 그저 해외 이론을 내가 이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TV 토론이나 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최대한 많은 공약을 쏟아낸다. 그런데 그 공약(公約)이 명절에 받는 화려한 포장의 선물 세트는 아닐까, 그저 말잔치로 끝나는 발표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매번 선거마다 속고 또 속지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이 이번에는 꼭 지켜지는 진정성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후보 자신의 말이길 간절하게 바란다.
이현희 안양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