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어둠이 서둘러 온다 했더니 수능을 치른다고 한다. 3년 전, 아이 어깨를 툭툭 치며 “하던 대로 해. 여태 했던 것처럼” 사뭇 씩씩하게 말하는데 가슴 밑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겨우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이 뒷모습이 참 많이 외로워 보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오롯이 네 몫이야. 엄마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코끝이 매웠다. 온전히 혼자 치러야 하는 일이다.
내가 시험 볼 때 엄마 마음이 이랬을까? 나는 아이의 눈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미열에도 죽을 끓이고,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고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아 키운 아이가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눈 맞으며 오래 걷기도 할 것이다. 햇볕에 등이 따가운 날, 젖은 양말을 벗을 수 없는 날, 봄처럼 생기 있는 날을 보낼 것이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기도 할 것이다. 그의 날이다. 내가 손댈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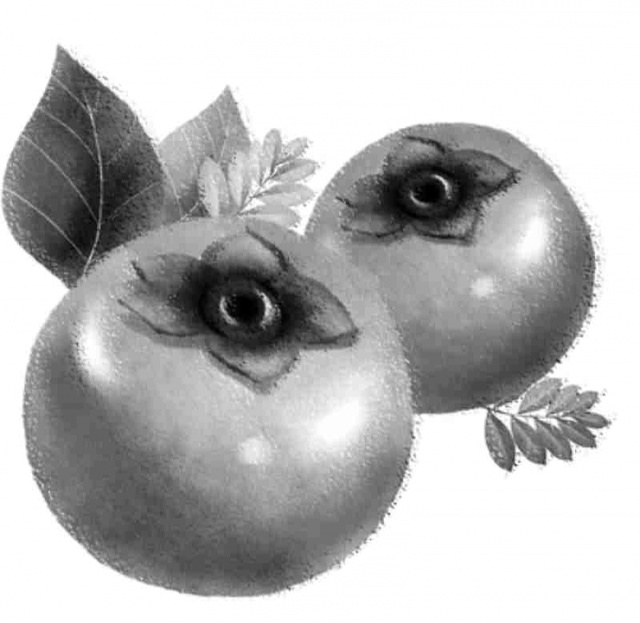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삐딱하게 말을 하고 신발을 꺾어 신고 문을 세게 닫는다. 아이는 내 마음대로 커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싫은 내 모습을 보며 자라서 나를 닮은 사람이다. 내 바람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다. 나처럼. 내가 부모에게 한 것처럼. 거울을 보면, 거기 내 아이가 있다.
따뜻한 말, 다정한 눈빛이 아이 어깨를 펴준다. 힘들면 쉬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생길 때까지 두리번거려. 그래도 괜찮아.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과 연구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