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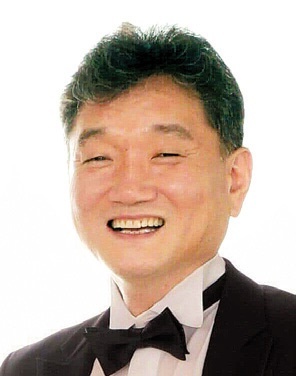
1970년대 초 서울의 허름한 판자촌이 도시 미관 때문에 철거됐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들은 시외 산골로 쫓겨났다. 거대 인구의 이동이기에 도시 기반 시설 마련이 우선돼야 했다. 그러나 별 준비도 없이 신속한 이주만이 재촉됐다. 사는 불편이야 어찌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거리를 위한 서울행 교통 편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화답은 전혀 없었다. 그저 사상적, 도덕적 매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8ㆍ10 성남민권운동, 성남 도시 형성의 시작이었다. 초기 성남의 평판은 이렇듯 험난하게 시작됐고 이후로도 계속돼왔다.
십수 년 전 성남 원도심의 한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했었다. 취임 초 투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과의 관계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애초 우려를 불식시킨 몇 장면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셋째 출산을 앞둔 한 엄마에게 산후조리 동안 어린 두 아이를 돌봐줄 곳이 전혀 없었다. 오래 고민을 했지만 쉬이 방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데 우연히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의 한마디, “무슨 걱정이냐. 우리 집에 보내라. 밥상에 수저 한 벌 더 올리면 애들 먹이고 이부자리에 베게 하나 더 놓으면 애들 재운다.” 이후 긴 고민은 저절로 해소됐다. 단오 복달임으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 한 할머니가 줄곧 직원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수차례 채근에도 대꾸가 없던 어르신은 파장 무렵 말문을 여셨다.
“나는 여기 올 수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는 오늘 아파서 올 수가 없었다.”
이리 얘기를 하시면서 꼬깃꼬깃 접힌 초대장을 꺼내셨다. 이후 옆집 할머니를 위해 포장된 삼계탕 그리고 부채를 받아 쥐고 연신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하던 어르신의 모습은 그저 훈훈하기만 했었다.
성남에서의 경험을 통해 필자는 하나의 확신을 하게 됐다. 바로 이곳은 이웃 간 따듯한 정이 있기에 분명히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참 삶이 펼쳐지는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비록 가난하지만 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예전과 너무도 다른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다. 도로 건너편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입주했다. 또 복지관 주변도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같이 놀자며 매달리던 아이들, 자식 못지않은 관심에 고맙다며 눈시울을 적시던 어르신들, 첫 모습은 까칠했지만 이내 하나 되었던 동네 사람들, 그들이 저 번듯한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까. 혹 옹색한 형편으로 더 멀리 다른 곳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둥지 내몰림’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한편 새로이 형성되는 동네가 예전 그 모습을 분명 기억하고 계속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다. 이웃의 정, 사람의 힘이 있어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 그래서 알찬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이계존 성남 산성동복지회관 관장/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