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동굴에서 광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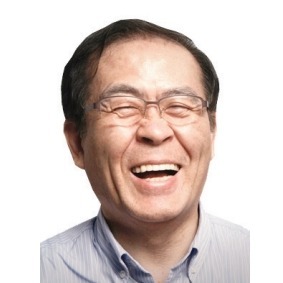
나는 말 많은 사람을 ‘말다공증 환자’라고 부른다. 그는 상대방의 관심이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한다. 남을 가르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이들이 많다. 소통을 가르치는 나조차도 남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대화를 주도할 때가 잦다.
그런가 하면 ‘묵언 수행자’도 있다. 도무지 말이 없다. 듣기만 한다.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듣기만 하니 두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소통을 가르칠 때 토킹스틱이란 걸 자주 사용한다. 토킹스틱은 작은 막대다. 여럿이 둘러앉아 어떤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말다공증 환자가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때 토킹스틱을 꺼내 그 사람 앞에 놓는다. 이제부터 말할 사람은 토킹스틱을 자기 앞에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그러면 말다공증 환자들은 토킹스틱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된다. 덕분에 목소리 작은 사람, 말주변 없는 사람, 숫기없는 사람 앞에 토킹스틱이 놓인다. 회의 때 토킹스틱을 이용하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다. 토킹스틱은 물병 같은 걸로 대신해도 된다.
말하기, 듣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살아간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기술이 말하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이 듣기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하기, 듣기에도 유형이 있다. 말하기, 듣기로 X, Y축을 만들면 4가지 유형이 나온다. 첫째, 말도 하고 듣기도 균형적으로 하는 사람. 둘째, 말은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 셋째, 듣기는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넷째, 말하기도 듣기도 안 하는 사람.
첫째는 광장형. 내 이야기도 하고 남 얘기도 듣는다. 둘째는 정보원형, 또는 묵언 수행자. 내 이야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듣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셋째는 마네킹형, 또는 말다공증 환자. 내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는다. 쇼윈도 안의 마네킹처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아는데, 정작 나만 나를 모른다. 넷째는 동굴형. 말하지도 듣지도 않고 소통을 거부한다. 나는 과연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말하기와 듣기에 균형을 이루는 광장형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균형이란 게 반드시 5대 5로 말하라는 건 아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때에는 불가피하게 묵언 수행자가 돼야 하고, 어떤 때에는 불가피하게 말다공증 환자가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는 2대 8이 좋다. 그러면 상사와 부하, 상담자와 내담자, 고객과 봉사자, 교사와 학생은 몇 대 몇이 좋을까? 상대방이 좋아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말다공증 환자가 돼주자. 중요한 건 동굴에서 광장으로 함께 나오는 것!
이의용 전 국민대 교수ㆍ생활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