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시대를 이기는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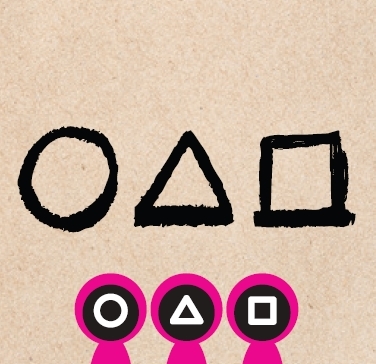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오징어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드라마는 승자가 패자들의 시체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패자를 기억하게 한다. 살아남은 누군가는 죽도록 노력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은 누군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각자도생의 길을 강요당한 인간의 선택은 비참하다.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가 겪는 불안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서바이벌 게임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오징어게임’ 열풍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넘어설 길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도 이미 불안사회에 들어선지 오래다.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전통적 양극화에 덧붙여 코로나 대유행까지 겪고 있다. 인구절벽, 직업 소멸, 일자리 불안, 지역 소멸의 위기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안에 맞설 수 있을까?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설 희망이 없는 것이 더 고통일 수 있다. ‘오징어게임’에서처럼 죽기 살기 게임에서도 양보하는 어떤 연대일까, 좀 더 치열한 계산일까, 요행으로 얻어지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친구를 뜻하는 깐부 맺기일까. 문득 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판을 바꿔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판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산업화 시기 근대적 학교교육의 틀을 만들고 전 국민이 교육받는 시대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뿌리산업의 위기로 중장년의 일자리는 더 찾기 어렵다. 또 은퇴 후 긴 노후를 견뎌야 한다. 한 번 배워서 평생 먹고살던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교육체제는 여전히 학교 중심이다. 실제 교육부 예산의 99%는 11%밖에 안 되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고 있다. 학교교육 중심 체제는 현상을 유지 시킬 뿐이다. 시대를 이기는 교육은 결국 학교 말고도 계속돼야 할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평생교육이라 부른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