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더닝 크루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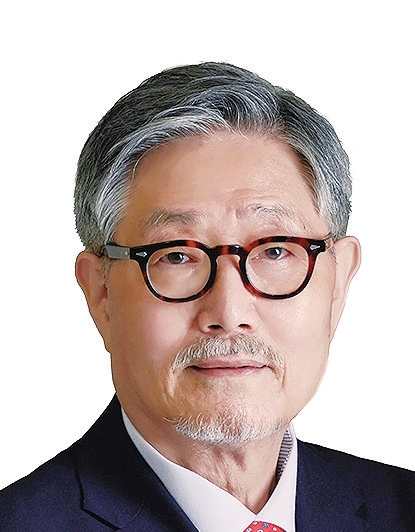
여러 사람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중팔구 정치 또는 특정 정치인이 화제로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 번 놀란다.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모두 정치 전문가가 됐는가 놀라고, 이러다 혹시 국민 한 사람당 나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다가 놀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아닐까 궁금해한 적 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때까지도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문화의 질량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경제지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좀 의외다 싶었다. 그런데 사실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었다. 선진국을 결정하는 경제지표에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문화가 짝으로 붙어 다닌다.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하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번 돈만큼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함께 쌓아야 부자라고 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IMF가 발표한 GDP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2021년 기준)다. 엄청난 부자 나라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하는 질량도 세계 10위일까?
1999년 코넬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무능한 사람의 착오는 자신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유능한 사람의 착오는 타인을 오해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를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빈 깡통이 소리가 더 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큰소리치며 잘 사는 세상을 보고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말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앞에 나서지 않고,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주름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원미란 작가의 단편소설 『고상한 소스의 세계』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대강 가늠된다. 우리는 ‘고상한 소스’를 먹으며 그게 음식의 참맛이라 믿는다. 이 고상한 소스에 길들이면 음식이 된 원재료는 까마득히 잊는다. 그래서 너도나도 고상한 소스로 자신을 감추는 일에 귀재가 되려고 한다. 양념 잘 치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사회, 이 또한 더닝 크루거 효과가 만든 현상이다.
‘고상한 소스의 맛’을 걷어내고 음식 원재료의 맛을 찾아내는 힘이 문화에 있다. 아무리 현란한 소스로 포장하더라도 음식을 만든 엄마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엄마의 손맛’을 제대로 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김호운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