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회 개원 유감

그런데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대목에선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다가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해야한다는 대목에선 심각해지기를 몇 번인가 반복하다보니 혈기가 발동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되면 세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 총선공약은 지켜야한다.’ 이런 요지로 말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왕에 반납할 거면 깡그리 다 반납합시다!’ 라는 말로 발언을 끝냈다. 덕분에 동료의원들 사이에 내 별명은‘깡그리 의원’이 됐다.
이번 국회개원협상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국회만이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매번 늦어지는 국회개원을 강제하기 위한 입법안도 서너건 발의되었는데 이 역시 다른 나라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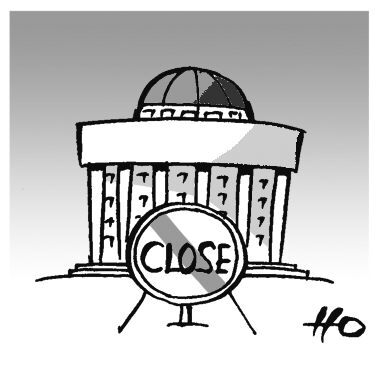
국회개원을 볼모로 한 ‘원구성’ 협상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시작은 24년전인 제13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제5대 국회에서 1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구조’였다. 그러던 것이 제13대 국회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기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하니 더이상 합의만 기대할 수도 없는 듯하다.
현재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되어 당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다듬는 단계에 있다. 즉,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다수당부터 상임위원장직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원구성조차 법으로 명문화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없을 수 없다. 법학통론 맨 앞장에 쓰여 있는 ‘법은 최소한의 것이다’라는 경구의 의미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함진규 국회의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