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해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 산정기간(매년 1월1일~12월31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다. 단 건설업, 벌목업은 보수총액신고가 아닌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다.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점은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다. 3월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보험료에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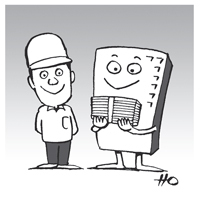
과거 2010년까지는 보수총액신고가 아닌 개산·확정보험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 및 납부했지만, 2011년에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통합이 되면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위에 설명한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이다.
과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만 신고하는 방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바뀐 것이다.
또 납부방법이 연 단위로 자진납부에서 월 단위로 부과고지납부로 됐다. 이것은 징수통합의 과정에 따라 징수 및 고지의 편리성을 위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했고 2013년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는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와 취득·상실신고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한 내로 신고해야만 과태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험사무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