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복숭아꽃과 복숭아 사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피해 사진을 찍었고, 또 그 사람들을 피해주느라 서로 비껴가기도 했던, 지천이 꽃과 사람들이었다. 복잡한 거리였으나 하늘을 가득 메운 꽃은 20년쯤 전에 와봤던 그 때와 변함없이 황홀했다. 단, 인공조명만 아니라면 완벽에 가까운 황홀의 재연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의집운영자들과 동아리회원 혹은 예술강사들과 함께 올해 진행될 내용을 함께 협력기획 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도 일이지만 각 지역에서 겪는 개인들의 사정과 상황을 얘기하면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떤 지역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복숭아꽃 축제가 복숭아 축제로 바뀌면서 축제 내용은 물론 개최시기도 바뀌었다는 얘기였다.
스치듯 잠깐 들은 얘기인즉슨 복숭아나무가 많아 4월 중순 이후면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복사꽃 축제가 열렸다고 했다. 그런데 복숭아 축제로 바뀌면서 일정도 9월로 바뀌었고 만발한 복사꽃이 아니라 복숭아가 주인공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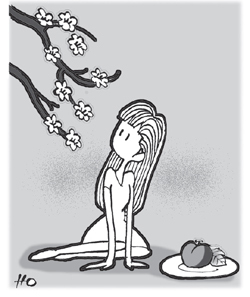
사람들이 그곳을 기억한다는 것은 일반적 공간에서 특별함이 들어있는 장소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꽃에 대한 황홀은 그곳만이 갖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공감하는 보이지 않는 공통의 장을 마련해준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생성이며 삶과 생산활동의 분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감수성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보다 기계의 말을 더 많이 배우는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현재의 우울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숭아꽃과 복숭아의 연결은 새로운 공유된 감정과 공통된 공간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더 풍요로울 것이다. 20년 후에 다시 그곳을 찾게 될 이유는 복숭아의 맛 보다 복숭아꽃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기에.
민병은 한국문화의집협회 상임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