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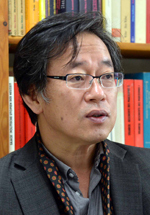
시대정신이 사회 또는 공동체에 무게를 두면 개인은 이에 피동적으로 동참하게 되지만 그 정신은 강한 사회통합의 요소로서 작동하게 된다. 반면 시대정신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강조되면 사회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강하지만 대신 공동체적 가치나 사회통합적 성격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를 그려볼 수 있다. 사회발전단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 역시 경제적 단계, 정치적 단계 그리고 문화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단계로서, 한국사회는 80년대 중반까지 경제발전이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였고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효과성·경제성·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단계로서는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와 평등, 인권 등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단계와 정치적 단계에서의 개발논리와 정치발전논리는 사회주도적인 시대정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럼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방향은 무엇인가? 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도 더 불안하고 오히려 사회통합이 깨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회발전 단계로서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문화적 단계에서 시대정신은 거시적·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미시적·개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개인적 가치가 강조되는 문화적 단계에서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또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 공감과 이를 통한 개인적 감동의 창출이다.
문화적 단계의 사회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과는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줄 때 대중적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부족해서 80년대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불가능한가? 아니다! 사회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사회참여는 예전처럼 사회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동과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이미 문화적 단계에 도달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시대정신은 개인적 가치에 기반한 감동과 스토리이다. 이 시대의 사회통합 역시 개인적 감동이 수반된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