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혈통보다 사회적 유대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는 지뢰를 밟아 장애를 입거나, 서커스단에서 퇴역한 늙고 병든 코끼리 등을 모아서 돌보는 ‘코끼리 자연공원(elephant nature prak)’이 있다.
이곳에서 어린 코끼리가 강을 건널 때, 네 마리의 어른 코끼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서로 밀착하여 보호하고 위협을 느끼면 누군가 트럼펫 비슷한 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 또 버마국경 밀림에서 지뢰를 밟아서 왼쪽 앞발이 성치 않은 코끼리의 경우 네 발이 성한 다른 코끼리들이 늘 자매처럼 따라 다니며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간다.
코끼리 집단이 반드시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미 이상의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을 보면, 가족이란 혈통보다는 사회적 유대를 본질로 하는 것인가 싶다.
운남성과 사천성 경계를 이루는 호수 ‘루구호’ 둘레에 사는 소수민족 ‘모서인 사회’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다. ‘모서인 사회’에서는 옛부터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어미 곁에 살았다. 모서인에게는 서구적인 의미의 혼인계약제도에 기초한 가족이 없다. 남녀는 ‘방문’을 통해 후대를 잇는다.
남자의 방문은 상호 애정에 기초하며, 사랑이 식으면 헤어진다.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어머니 곁에 머무른다. 그리고 외삼촌과 이모 그리고 마을 전체가 아이를 돌본다. 그러니 ‘가정해체’란 게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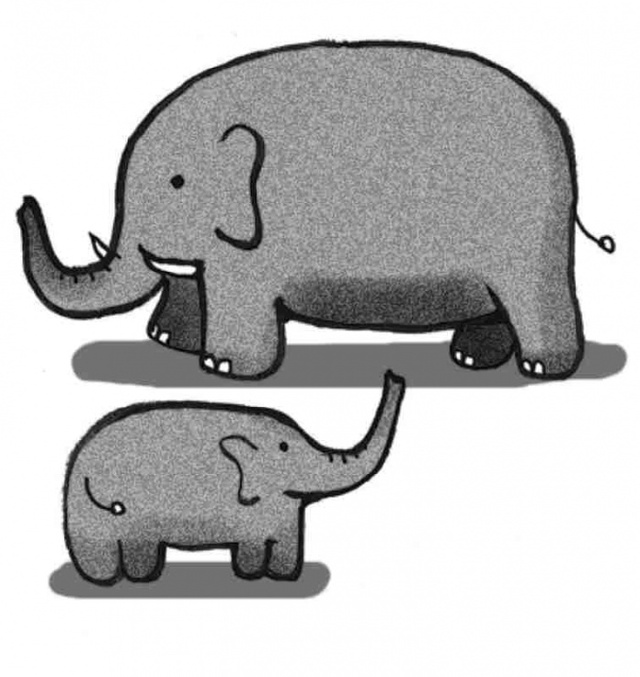
또, 일본인이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랍비가 되어 활동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인 범주는 점차 관대해지고 있지만 ‘유대인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그 소속감과, 공동체를 지켜야한다는 유대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 같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유대인을 돕기 위해 막대한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대표적으로 1991년 5월 에티오피아 내전 격화로 집단 학살위기에 놓인 흑인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만에 3천5백만달러란 거금을 모아 몸값을 냈고, 이스라엘군이 ‘솔로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이틀만에 이스라엘로 공수해 온 사례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요시하고 살아 왔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쓰나미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혈통에 기반되는 ‘사회적 유대’란 서로 쓰다듬고 돌보는 데서 비롯한다. 사회적, 집단적 유대가 결여된 혈통은 의무만 남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정길배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사업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