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부분이 전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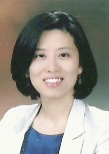
지도교수님께서 “김영란법 문제도 있고 하니 밥값은 각자 냅시다”하며 외부에서 오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6천원 씩 걷어서 식사비용을 내셨단다. 심사를 받는 자신은 일부러 먼 길을 와주신 외부 심사위원들께 송구하고 민망했지만 지도교수님의 깔끔하고 엄격한 성격을 잘 아는지라 토를 달수도 없었다고 했다. 학부 때부터 뵌 선생님이셔서 그 장면이 너무도 눈에 선해 빙그레 웃음이 났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 어떤 교수가 정치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연구비로 아이들 밥을 사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도대체 그런 교수가 어디 있나 싶었다. 학생들에게 못된 짓을 한다는 교수, 연구비를 유용한다는 교수,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따라다니느라 정작 학교에는 있지도 않다는 교수, 심심치 않게 언론의 단골 기사가 된다.
특히나 그런 교수들이 있는 대학은 그 대학 모든 교수가 그런 것처럼 여론과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겠으나 백면서생인 교수들이 그리 되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식당,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이런 문제와 큰 상관이 없지 않은가.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했다. 정작 우리는 화를 내야 할 순간, 비난해야 할 사람, 뜯어 고쳐야 할 곳, 그 몇몇을 보면서 그 전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현희 안양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