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악의 축, 선의 축

그러나 운동을 전폐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고,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오류나 불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서로를 제약한다고 여겼던 상충관계가 실제로는 독립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상충관계라고 여겼던 개념을 두 개의 다른 축으로 간주하는 이차원적 관점을 양면성(ambidexterity)이라고 부른다. 양면적 관점은 어느 하나를 버리거나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위생요인)와 만족을 주는 요소(동기요인)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위생요인에는 급여, 회사정책 등이 있고, 동기요인으로는 성취감, 자율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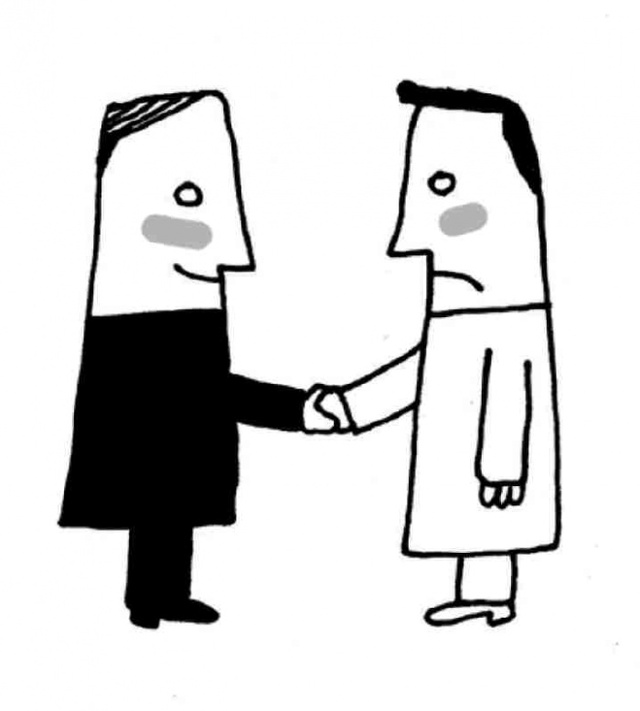
선과 악의 갈등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악을 없앤다고 선이 구현되지 않는다.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악인으로 내몰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선과 악은 동시에 존재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악보다는 선을 더 행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정치인에게 도덕교과서를 빗대어 선악을 가르는 언쟁을 벌이곤 한다. 언쟁에서 밀린다 싶으면, ‘다 그 놈이 그 놈이다’라며 짐짓 세상을 통달한 냥 슬며시 발을 빼기도 한다. 애초부터 정치에 절대선을 비교 잣대로 사용하는 방향이 잘못 맞춰졌는지 모른다.
정치를 ‘덜 나쁜 놈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정의했던 함석헌 선생의 금언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면성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진취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진취성을 잃지 않고 건전한 사회적 양면성을 구현하려면, ‘뽑을 놈이 없다’라고 말하는 졸렬한 자세를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한다.
우형록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겸임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