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목숨까지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1912년 4월 14일, 뉴욕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1,5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 C. 래히틀러 부선장이 남긴 회고록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감동이 담겨 있다. 침몰이 확실해지자 선장은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많은 여성승객들은 구명을 거부하고 가족과 운명을 같이 했다. 남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부인, 여성에게 양보하고 신사답게 죽은 은행가, 보트에 먼저 탑승하기를 거절한 노신사, 아이들을 부탁하고 가라앉은 아버지, 탑승을 거부하는 아내를 기절시켜 내려 보낸 남편, 아이를 키워야 할 젊은 엄마에게 양보한 여성, 가난한 부녀자에게 기회를 내준 저명인사들, 아내만 태워 보내고 작별인사를 한 세계최고 갑부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이해(利害)가 걸린 일에는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은 남에게서 내 것을 차지하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사회도 세렝게티 벌판의 먹고 먹히는 이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본령이지만, 사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정권의 도움과 시장 논리로만 성장하여 그런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 성장배경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넓은 불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전문가 경영을 회피하고 능력과 무관한 족벌 세습을 하려고 든다. 리더의 능력이 조직의 존망을 좌우 한다는 것을 모를까.
한국 최고 재벌의 경영자가 정권의 힘을 빌려 도모한 일이 들통 나 법정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무모하다. 1970년대 성장기에 노동자들의 희생과 정부의 수출 부양정책, 소비자들의 애국에 기댄 결과가 오늘 기업의 융성이다. 30년 전, 나는 유럽의 한 가전매장에서 일본제품에 밀려 낮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한국제품을 바라보며 자존심 상했던 적이 있다.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기는커녕 탈세와 변칙상속으로 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오래 전, 유일한 박사가 보여준 모범을 흉내라도 내보는 게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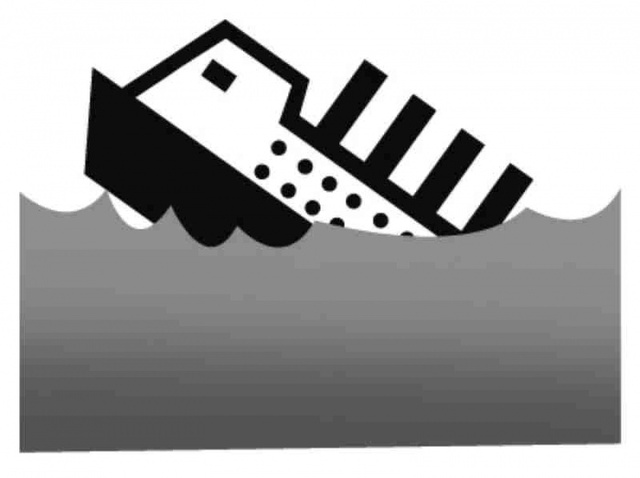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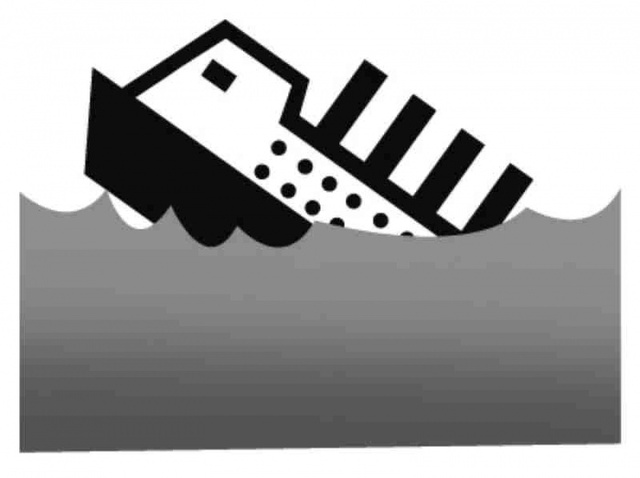
재벌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성공했다는 교회마저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힘들게 개척해서 이룬 것이 아까워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남을 위해 목숨까지는 내어주기 어렵다면 의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목회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신자들의 순박한 믿음과 충성이었다. 종교인과세를 두고도 옹색한 이유를 대는 자들을 보면 염치가 없어 보인다. 시대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걱정이나 끼친다면, 교회는 사회에 부유하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줄 수 있는 조건이 축복이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천년의 시간을 건너며 인류는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는 낮은 곳에서 태어나 보잘 것 없는 갈릴리 공동체로 하늘의 의(義)를 이루려 했다. 그가 소중한 목숨을 내준 사실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감동하는 것이다.
타이타닉호의 절망 앞에서 의연하게 자존을 지킨 이들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숭고한 존재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거듭하게 한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운송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목숨을 다른 이에게 내주고 심해로 가라앉은 수많은 예수들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도 삶의 각박한 순간마다 부활한다.
주용수 한국복지대학교 교수·작곡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