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로봇과 협업 상생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벌어진 기계와의 터널 굴착 시합에서 승리한 것은 뜻밖에도 존 헨리였지만 혼신의 힘을 다한 헨리는 그만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뭇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인간이 기계로부터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생산성만 우선하다 보니 상생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로봇의 밀집도가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갈수록 축소되고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로봇 활용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가 716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중·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간의 일자리가 일방적인 자동화와 무인화로 대체되면서 대기업들의 막대한 이윤 축적은 로봇세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방적인 로봇 도입보다는 노사가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책무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한 지능형 로봇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전문 직종을 비롯한 사무행정직의 일자리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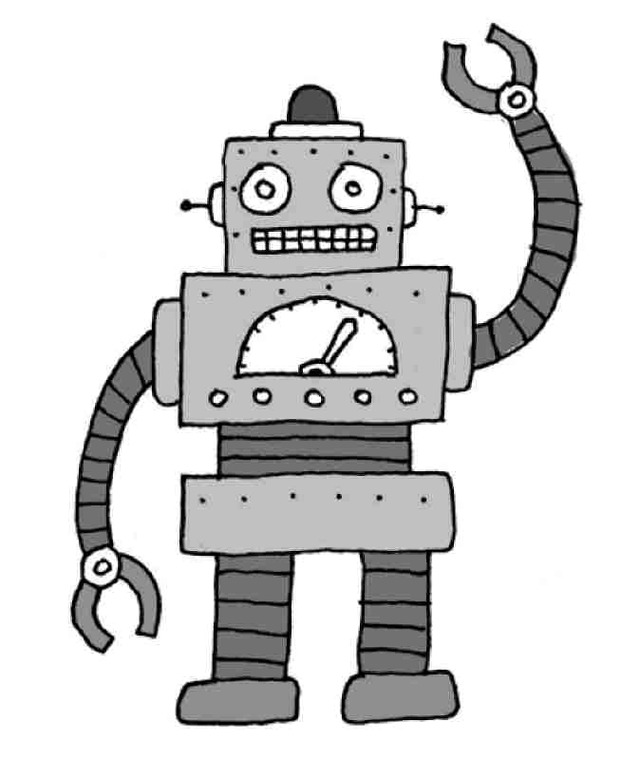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부단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예측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AI 로봇과 함께 일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협업형 인재를 키워야 하고, 또한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로봇과 상생 협업하며 직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응훈련 제도가 마련되어 노인층도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노인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