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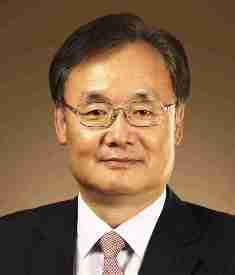
지난 수십년간 파리 시내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루브르박물관 안마당의 유리 피라미드와 퐁피두센터 외에 과연 몇 채나 될까? 파리 대부분은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 시대에 거의 완성되었고, 파리 시내의 유명한 하수구와 대로변 물청소 시스템까지 그 시대에 완성되었다 하니, 그 후 150년간 파리는 에펠탑 신축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유럽의 최고 변방지역인 지중해의 외딴 섬나라 몰타도 예외는 아니다. 16세기 몰타기사단이 건설한 수도 발레타는 여의도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바둑판식 도로들 양편으로 3~4층 석조건물들이 빈틈없이 차 있고, 중무장 기사들이 말 타고 달리던 골목길에는 차량 행렬이 분주하다. 건물 지하에는 가히 1천명은 수용할 만한 거대한 콘서트홀도 있고, 이슬람의 침공을 막으려 건설했던 수십개의 거대한 방어 요새들 덕분에 2차대전 기간 중 영국군은 나치독일의 몰타 침공을 버텨낼 수 있었다. 이런 고도의 문명을 건설했던 중세시대를 왜 역사가들은 ‘암흑기’라 부르는 것일까?
눈길을 이탈리아로 옮기면 시간의 호흡이 훨씬 길어진다. 길게는 2천년, 짧게는 300~400년된 로마 시내 건물들이 아직도 정부청사, 대사관, 은행,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토스카나 지역에는 전체가 몽땅 중세시대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와 마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로마에는 2천년의 풍상을 견뎌낸 거대한 판테온 신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성당으로 사용 중이고,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 절벽 위에 건설한 반원형 극장에서는 지금도 연극과 오페라가 공연된다.
그런 곳에서 이삼년 살다 한국에 돌아오면 너무도 빠른 변화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다. 수십년 눈에 익은 아파트와 고가도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몇년전까지 다니던 상점과 식당들이 철거된 자리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서울 시내 도처에 새로 생긴 버스 중앙차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무인대여소 등을 보노라면 여기가 내가 살던 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조세제도, 은행 대출제도, 한글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뀌어, 뭘 하나 하더라도 외국인 이민자처럼 여기저기 물어봐야 한다.
그런 속도감 있는 변화에 적응하기가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그것은 그간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의 혁명적 변화와 진보를 계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견스러운 모습이자 잠재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즐비하게 늘어선 서울 시내의 새 고층빌딩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100년 후에 그 중 몇 채가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00년 후에는 서울 시내에 고궁들과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석조로 지어진 한국은행 본점과 서울역 구청사 정도 외에는 현재 모습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한다.
건물들을 그리도 빨리 부수고 새로 짓는 이유는 기존 건물이 날림으로 지어져 수백년 보존될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유럽처럼 건물 하나 짓는데 수십년 수백년을 투자한다면 절대 그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라의 제도가 그리 빨리 바뀌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도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젠 우리도 발전을 할 만큼 했으니, 수백년간 보존될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시대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수백년간 길이 남을 훌륭한 제도들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용준
前 주이탈리아 대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