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까마귀와 사회적 편견

여기에는 검은색의 까마귀가 흉조로 마음에 안 들거나 재수 없다는 심리적 이유가 배경에 깔려있다. 수원시청 담당부서는 까마귀떼 출현지역이라는 경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경고문자, 방송을 하고 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양한 민원에 부딪히고 있다. 공원에 모기가 많으니 모기를 치워달라, 하천에 뱀이 있으니 뱀을 없애 달라, 하천에 자라는 풀들 때문에 모기서식처가 되니 모기약을 치고 풀들을 전부 베어달라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드러나는 생명현상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몰이해적 민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떼 현상처럼 언제부터인가 까마귀가 제비나 까치, 참새 등 다른 조류와는 다르게 흉조로 인식되면서 혐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본디 까마귀는 선조들에게는 길조였다는 자료와 이야기를 넘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점증하는 혐오주의와 편견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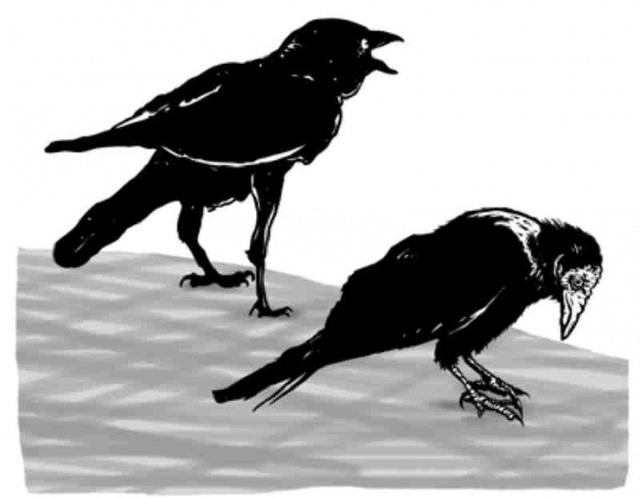
사회심리학자 캐럴 태브리스에 의하면 편견은 의심, 두려움, 불안을 물리쳐주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만들어주며 무력감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의 확실한 치료약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더 못난 사람이 있다고 믿으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편견이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만, 낮은 자존감의 치료약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까마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까마귀의 생물학적 실체와 자연과 도시공동체의 공존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적 편견 역시 사회구성원들 간의 경험적 접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안정감, 사회적 통합성, 개인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족적 지역적 유대감을 세심히 올리는 우리 안의 장치가 필요하다.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