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암환자 가족도 아프다

물론 모든 질병은 가족이 함께 질병여정에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유독 암은 참으로 환자와 가족을 힘들게 한다. 암환자 가족이 힘든 것에는 환자 섭생 관리와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상이 있다. 죽음과 이별을 내포하며 견디어야 하는 긴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
캐나다의 의료사회학자 아서 프랭크는 그의 저서 ‘아픈 몸을 살다’(메이 역)에서 본인의 암 질병여정을 통해 체험한 의료사회의 면면을 사유하며, 의료진은 암을 치료하지만, 암을 가진 환자의 존재를 끌어안아 주는 이는 가족임을 이야기한다. 그런 가족을 의료사회에서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일침과 함께 가족의 질병과정 동반에 귀 기울여야 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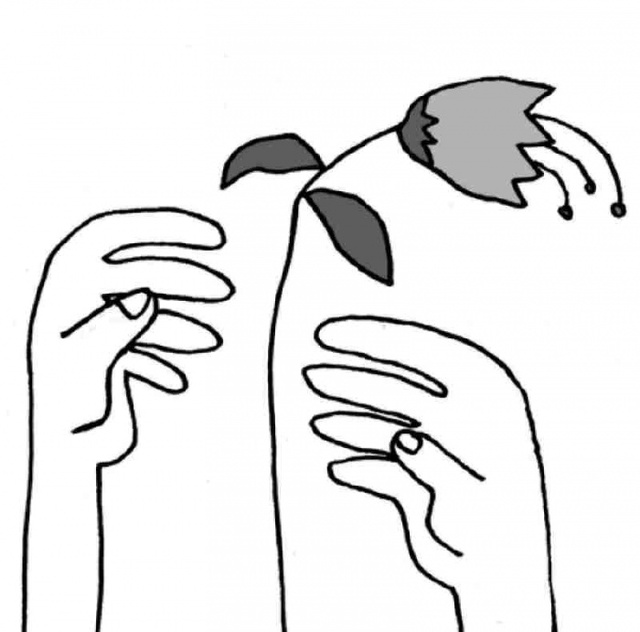
우리나라 암환자 가족의 우울과 자살 시도율이 심상치 않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암환자 가족의 82.2%가 우울증상이, 38.1%는 불안증상이 있고 17.7%가 지난 1년간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 암환자 가족이 아프다.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역시 암환자와 가족을 아프게 한다.
아직도 암은 ‘진단’과 함께 ‘선고’ 받는 경우가 있다. 질병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암적 존재’란 어떨 때 사용하나. 우리 사회문화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암에 대한 부정 인식, 암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암은 치료가 끝나도 재발의 불확실성을 한동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시기일 수 있다. 표적치료제와 맞춤치료가 시작되어 희망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치료는 참 힘들고 긴 과정이다.
이 긴 치료 여정에서 암환자는 가족 때문에 치료받고, 투병의 의지를 가지게 된다.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낼 힘도 가족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암환자들은 가족이 너무 고맙다. 하루에 열두 번도 바뀌는 암환자였다가 정상인이었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는 것은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다.
나와 함께 살아내주는 이, 그들이 가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암환자 가족도 함께 돌보는 의료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은영
가천대학교 학사부처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