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선거 이후에 남겨진 숙제

경기도의 경우 광역의회 여성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2.5%이고, 31개 시ㆍ군의 기초의회 여성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39.5%로 4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시작된 1991년 경기도의회 여성비율 0.9%, 31개 시ㆍ군의 기초의회 여성비율이 0.9%이던 것과 비교하면 광역의회는 25배, 기초의회는 43배 정도 증가했다.
지방의회 제도의 도입 초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가부장적 문화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토대가 부족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은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고, 경기도는 지역의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각 정당에게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공천 비율을 할당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정치 진출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광역의회에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도가 의무화된 2006년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4년전 7.7%에서 14.3%로 두 배 증가했고, 기초의회 여성할당 및 교호순번제도가 의무화된 2010년 기초의회 여성비율은 4년전 15.6%에서 27.1%로 증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의회에서 선출된 비례대표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으로, 비례대표의 홀수번호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의 경우 1번을 받은 각 정당의 후보가 다수 선출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지방의회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있어 선거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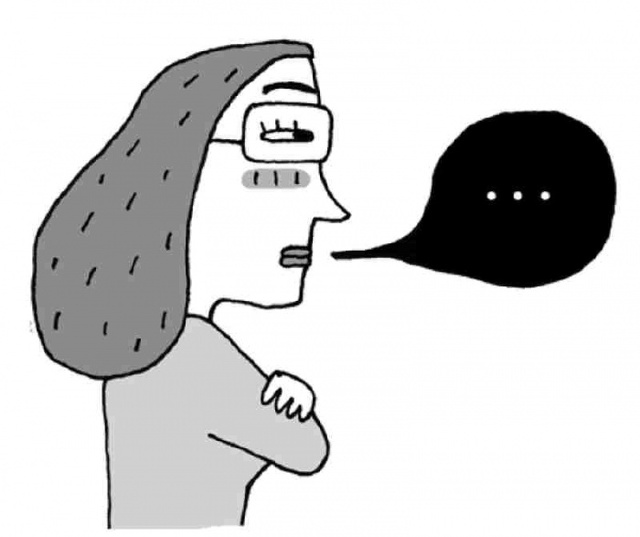
전국적으로 여성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의 성평등 정책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이에 관한 논의와 공론화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이후 있을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가 던져졌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고민할 때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