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4차 산업혁명과 도예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구에서 그림이나 조각은 물론 가구와 옷을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일들은 삶을 꾸미는 하나의 기술(arts)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의 등장으로 사물을 똑같이 묘사하는 기술이 무의미해지자 화가들은 실용성을 버리고 ‘순수미술’을 표방했다. 그리고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구와 옷, 책, 식기 같은 물건들이 대량생산되면서 이를 도안하는 새로운 분야 즉, ‘디자인’이 탄생했다. 한편, 획일화된 공장제품과 차별하여 고품질의 손맛을 지닌 전통방식 도예는 오늘날의 ‘공예(craft)’의 영역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항상 예술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의 근대 도예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외세에 의한 산업화로 자각 없이 요업과 분리된 한국도예는 해방 이후에야 전통·생활·조형도자로 방향이 구체화됐다. 그리고 80년대 가스가마와 전기물레의 보급으로 1인 도예가가 늘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재에는 점차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져 밥그릇 하나에도 전통성과 조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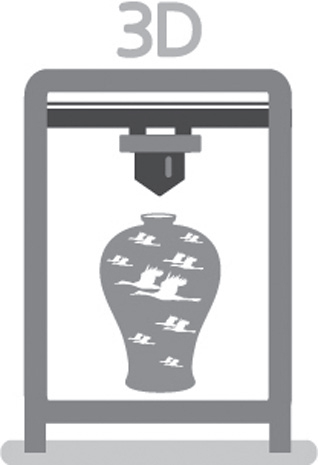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오늘날 주목되는 신공예 현상의 하나는 ‘메이커(maker)’다. 다양한 재료와 다루기 쉬워진 연장으로 각종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DIY 취미에서 시작된 메이커 운동은 이제 3D프린터와 아두이노(상용 로봇제어 모듈)를 무기로 혁신제품을 창작하는 제조업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리고 도자공예에서도 이미 3D프린터와 신소재를 이용한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메이커의 등장으로 디자인과 공예는 다시 융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이커는 디자인을 하지만 만드는 제품은 다품종 맞춤형 생산의 공예품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도예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기존의 도예는 위축될 수도 있지만 기술의 융복합으로 도예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리라 본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SNS와 가상현실 기반의 다양한 관련업종도 생겨날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내년 여주 도자세상에 융복합 도예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선구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또 한 축인 인공지능은 정보처리를 넘어 예술까지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언젠가는 사이보그 도예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도예의 가치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구현으로 행복을 찾는 데 있다고 해야겠다. 르네상스적 관점에서 보면 신과 동물 사이에서, 혹은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간성의 본질은 전통계승과 창의성으로 귀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예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다.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