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즘 지진, 화재, 장마 등 재난에 대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다. 천재지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던 지진도 인간이 행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지열발전소 현장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역시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주변 변압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며 규모가 점점 켜져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의 중대함을 인지,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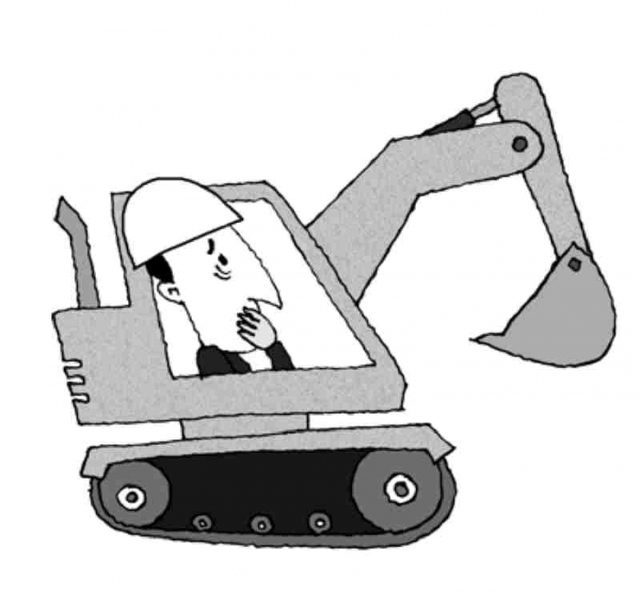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서 ‘건축법 제11조 1항에 의거 건축허가 전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공사 두 곳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공사 중,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탓에 건축허가 기간도 기본적으로 3~6개월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곳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지하 굴착 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 좋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필요한 법을 제정한다 해도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지자체 몫이다. 법의 취지를 보면 꼭 건축허가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착공 전까지 평가가 이루어져도 될 것 같다.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 요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건설업만큼 각계각층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게 또 있을까?
김동훈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