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건축·시설물 누수, 안전 인식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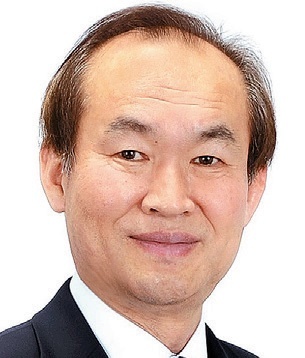
매년 우기철과 장마철에 들어서면 하루가 멀다하고 수없이 발생하는 시설물 누수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설물 누수가 가져오는 국민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로 누수 피해가 직접적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아 설계자·시공자·감리자·정부 기술 정책 관계자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요구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외치며 외형적으로는 초고층, 장대화된 기반시설과 지하공간이 급증했지만 시설물 누수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시설물에서의 고질화된 사회적 이슈로는 ‘구조체 균열과 누수·결로·실내 소음·실내공기질 오염’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결함 중 결로·실내 소음·실내 공기질 오염은 주로 건축 및 주거 시설물에서 나타나고, 균열·누수는 건축 및 토목시설물 모두에서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다.
아무리 스마트 기반시설·지능형 건축시설의 건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누수 사고는 그 시설의 품격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누수는 구조체(콘크리트, 강재)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철근(철강)을 침식(부식)시켜 점진적 붕괴(Progress Collapse)를 일으키고, 지하공간에서의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수 고갈·수위 저하·오염에 의한 환경 피해를 주며, 교통기반시설에서의 전기 누전·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 사고를 일으키며, 실내 공간에서는 결로·곰팡이·미생물 서식·악취로 인한 생활 건강에 피해를 입히며, 보관 및 저장 물품 등 자산 가치를 훼손시키며 시설물 안전·사용자 안전·자산 가치·사회 비용 증가 등 다양한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사전적 예방 조치(방수 기술)와 사후적 관리 조치(누수 보수기술)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이다.
건설 구조물이나 생산 후 사용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성능, 기능은 감소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누수 현상이다. 따라서 누수는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써 이를 무시해 발생한 크고 작은 피해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누수 피해는 지진, 홍수, 태풍처럼 순간적 붕괴(Momentary Collapse)를 일으키는 재해(天災)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인식도 부재했고, 민간 시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외적 항의를 못하고, 공공시설은 사회적 책임 추궁으로 겉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또한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설구조물은 교체(교환)도 불가능하고, 보수 혹은 폐기처리가 어려워 더욱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건축 및 토목 관련 시설물)의 사용이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물 누수가 재해 발생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우리는 유사한 누수 사고의 잦은 발생을 기술자의 시공 능력 부족·기준 준수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부르며, 그 인재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가 정부의 정책 부재·미흡·실패로 볼 수 있어 이를 관재(官災)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는 건설구조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불안전 위해 요소로서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방수시공·방수감리·누수보수 등 기초 공통기술(뿌리 기술)에 대한 정비·개선·보완·성능고도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