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도사편찬 재개의 의미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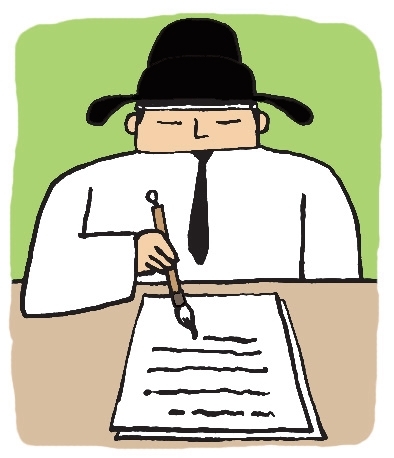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로 기록된 총 1천893권 888책이라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실록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은 사관(史官)이 기초자료 작성부터 서술, 편수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담당했다.
역사편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사관이 매일 기록한 원고를 사초(史草)라 하였는데 그날그날의 시정(時政)과 관리들의 현부득실(賢否得失)이나 비행(非行)이 기록되었다. 사초는 실록의 기초자료가 됐다. 실록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역사기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신뢰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임금도 사초나 실록을 볼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역사서와 논문을 쓸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과 TV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바탕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매우 믿을만한 역사서가 자리 잡고 있다.
필자가 조선왕조실록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09년 종료되었던 경기도사편찬사업이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195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지(京畿道誌)』를 발간하는 등 경기도는 선도적인 지역사 편찬의 경험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튼실해진 2010년대 이후로는 외려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도사편찬의 재개가 가져올 긍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사편찬 조례제정과 편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올해 문화유산과에 도사편찬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새로운 도사편찬의 기조를 ‘새롭게, 도민과 함께, 쓰임새 있게’로 정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면서도 그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정사료(道政史料) 수집과 정리가 시급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현대 경기도정에 대한 사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역사 서술만큼이나 사료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관점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관찬사서(官撰史書)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조선시대와 달리 사료에 대한 2, 3차 가공은 민간도 가능하기에, 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기초자료를 잘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현재의 도정실태를 가감 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 연구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중앙도 지방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인해 지역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젊고 유능한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북돋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단순한 과거 역사서술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경기도사편찬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