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새천년 유라시아 통신] 황해 선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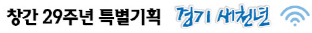
7월 3일 유라시아 대륙 14,735km를 32일간 횡단하는 긴 여정에 올랐다.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와 서유럽을 가로질러 포루투칼 리스본까지 열차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8월 3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다. 여정의 출발 지점은 평택항이다. 평택에서 중국 롄윈강항까지는 단동 페리호를 타고 갔다. 페리호의 정원은 1천500명이 넘는데 사드 영향 때문인지 승객은 450명 정도이다. 이번에 같이 가는 일행은 학자, 언론인, 문화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다. 모두 13명인데 3명은 전 일정을, 10명은 일부 구간만 함께 한다. 출발 전 태풍 소식이 있어 배 멀미를 걱정했으나 황해 바다가 생각보다 평온해서 견딜 만하다. 2인 1실에서 쉬다가 모이기만 하면 토론을 한다. 출발한지 하루가 안 되어서인가?

한국 역사에서 황해는 세계 중심으로 가는 바닷길이었다. 신라는 당성 당항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었던 중국 당나라와 교역하면서 발전하였다. 의상대사와 원측, 그리고 최치원도 당성 당항포에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당나라로 갔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 화엄종을 열어 신라사회 지식수준을 크게 높였다. 원측은 당나라에 머물면서 불경을 번역하고, 저술을 남겼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해서 망하고 있는 신라를 구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지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고려시대에도 황해는 세계의 중심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고려 상인들은 벽란도에서 황해 바다를 통해 중국 송나라와 교역하였다. 이 때 아라비아 상인도 황해를 건너 벽란도를 출입하였다. 신라와 고려시대 황해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넜던 바닷길이다.

20세기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하늘 길과 바닷길 밖에 없었다. 21세기 들어 육로가 열리고 있다. 18세기 이후 막혔던 실크로드가 철의 실크로드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길은 사람과 물자를 오가게 하고 새로운 문명도 만든다. 이 길은 21세기가 가기 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명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길목에 있는 중국의 중서부와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 가서 살펴보고, 외교관과 기업인, 전문가와 현지 교민들을 만나 그 가능성과 변화상에 대해 들어보고 토론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탐사가 끝난 후 경기일보 지면, 영상물, 출판물을 통해 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평택항에서 출항하기 직전 수원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 당성 문화콘텐츠 학술대회’에서 ‘당성과 철의 실크로드, 유라시아 대륙 횡단 콘텐츠 제시’란 제목의 글을 발표한 것도 이번 프로젝트를 학계에 보고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7월 4일 저녁 6시 30분 중국 롄윈강 항에 도착하여 중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탐사 기간 중에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경기일보 지면의 ‘유라시아 통신’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에게 전할 계획이다.

강진갑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장,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후원: 경기문화재단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